Ⅰ. 서 론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 내 또는 도심과 도심, 도심과 지역, 지역과 지역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항공교통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2인승에서 5인승 규모의 수직이착륙 기체(fleet)가 지상으로부터 300m에서 600 m 사이 (약 1,000∼2,000 feet AGL; above ground level) 고도를 비행하는 운용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국토교통부, 2020).
통상적인 UAM의 운항 고도는 기상학에서 사용되는 대기의 연직 구조 중 ‘대기경계층(atmospheric boundary layer, ABL)’에 해당하는 층으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1∼2km 고도에 이르는 대류권의 최하부를 의미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항공항행을 위한 부속서 제3권 (Annex 3)에 의하면, 항공관측보고(aircraft observations and reports; air-reports, AIREP)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난류(turbulence)는 난류 에너지 소산율(eddy dissipation rate, EDR)로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ICAO, 2018).
EDR은 항공기의 크기나 무게 등과 관계없이 난류의 물리적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는 0에서 1 사이의 값1)을 갖는다. ICAO Annex 3에서는 중형급 운송용 항공기(medium-sized transport aircraft; Boeing 사의 B737와 Airbus사의 A320 등)의 순항 조건을 기준으로 peak EDR 값 0.10, 0.20, 0.45를 각각 약한(light), 중간(moderate), 심한(severe) 난류 강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종사나 승객이 실제로 체감하는 흔들림 정도는 항공기의 무게, 속도, 고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CAO, 2018).
Sharman et al.(2014, 2017)은 실제 탑승객이 느끼는 항공 난류 강도에 맞게 EDR 값을 보정하기 위해 수 만에서 수 십 만 건에 이르는 조종사기상보고(pilot-reports, PIREP) 자료를 EDR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보고된 난류 강도가 세질수록 EDR 값과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항공기별 임곗값 설정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PIREP은 조종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는 것으로 개인 성향 또는 숙련도에 따라 같은 현상이라도 그 강도는 보고자별로 다르게 보고되는 경향도 있다(Splitt et al., 2021). EDR은 공식적인 항공 난류 지표로 권고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중형급 운송용 항공기의 순항 조건에서 PIREP과의 비교 및 검증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므로,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하는 대기의 하층, 즉 대기경계층에서는 그 활용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Kim et al.(2024)은 K-UAM 실증지인 고흥에서 관측한 바람 데이터를 활용하여 EDR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난류의 일변화 및 계절변화, 풍향별 난류 강도, 해륙풍에 의한 난류 사례 분석으로 UAM 실증지의 난류 특성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기경계층에서 어떠한 물리적, 역학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UAM에 연관된 항공 난류 분석에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적인 항공 난류 지표로서 EDR을 실증지의 난류 분석에 사용한 것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UAM 기체는 크기가 작고 경량 구조로 인하여 동일한 난류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운항 고도에 해당하는 대기경계층은 난류의 길이 척도가 작고 시공간적 변동성이 큰 특성을 보인다. 특히 대기경계층에서는 난류의 비대칭성과 비균질성으로 인하여 관성 범위가 잘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고도 항행에 기반하여 정의된 EDR 지표가 대기경계층 내 UAM 운항 환경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Chu et al., 2025).
Won and Kim(2023) 및 Kwon et al.(2024)은 한강 VFR(visual flight rules) 회랑을 중심으로, UAM 운항 고도에서의 해륙풍에 의한 윈드시어 분석을 통해, 대기경계층 내 바람 변동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대기경계층이 배경 기상 조건이나 지형 요인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저고도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지적인 고해상도 기상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이 강조되었으며(Cho and Kim, 2020), 이는 도심 저고도 상공을 운용하는 UAM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UAM 운항 환경에 적합한 난류 지표 설정을 위해서는 대기경계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항공항행 체계에서 사용되는 항공 난류의 개념과 UAM이 주로 운항하게 되는 대기경계층의 기상 특성, 그리고 대기경계층의 난류의 종류와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항공 난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기경계층 내의 항공 난류의 진단과 예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항공 난류는 대기 중의 불규칙하고 작은 규모의 대기 운동으로 인하여 항공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흔들림을 겪는 현상들을 의미한다(Lester, 2013). 이는 단순한 진동을 넘어 항공기의 자세, 고도 편차, 비행경로 이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난류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 주요한 기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난류는 구름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기의 모든 고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탐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종사의 사전 인지와 회피가 어렵다.
ICAO(2018)는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나 승객이 체감하는 흔들림의 강도에 따라 난류의 단계를 분류하고 있으며, 각 등급은 항공기의 속도, 고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공 난류는 주로 난류 발생 메커니즘과 위치, 그리고 구름 유무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대류성 난류(CIT; convective-induced turbulence)는 강한 상승류와 하강류가 혼재하는 적란운 등의 대류성 구름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때 형성된 미세 소용돌이는 항공기에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도 상승 중인 항공기에 더욱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Sharman, 2016). 한편, 구름 주변 난류(NCT; near-cloud turbulence)는 구름 내부가 아닌 외곽 또는 구름 상부의 인근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대류 구름의 주변부로 퍼지는 강한 연직 유속이나 붕괴된 중력파로 인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ne et al., 2012). 대표적으로 적란운의 구름 가장자리에서는 수십 km 밖까지 강한 난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시각적으로 탐지하기 어려워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다.
산악파 난류(MWT; mountain wave turbulence)는 지형에 의한 대기 흐름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고도가 높은 산맥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안정한 대기층을 만났을 때 지형성 중력파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대류권 상층 또는 성층권 하층까지 강한 진동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산악파가 붕괴하거나 공기 유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구름 영역에서도 격렬한 난류가 발생할 수 있다(Worthington, 1998). 특히 산악파 난류는 구름이 없는 청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청천 난류(CAT; clear air turbulence)는 구름이 없는 청명한 공기에서 발생하는 난류로서, 주로 대류권 상부나 성층권 하부의 연직 또는 수평 윈드시어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제트 기류 주변이나 강한 기압경도로 인한 전선대 상층에서 풍속 변화가 클 때 청천 난류가 자주 발생하며, 시각적 징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식별하기 어렵다. 실제로 청천 난류는 비행 중 예고 없이 발생해 승객 부상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난류 유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고도 난류(LLT; low-level turbulence)는 지표면 부근의 대기경계층 내에서 발생하는 난류로, 기계적 난류와 열적 난류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Lester, 2013). 기계적 난류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면 마찰과 지형 굴곡으로 인해 공기 흐름에 전단이 생겨 발생하는 난류로, 지표 부근에서의 강한 바람이나 거친 지형일수록 난류 강도가 커진다. 열적 난류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 경우 태양복사에 의한 지표 가열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며 생기는 난류로, 맑은날 햇볕으로 달궈진 지표 위에서 경계층 내 대류가 활발해져 지표면 인근에서도 뚜렷한 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저고도 난류는 주로 이착륙 단계의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도심처럼 지표면이 복잡하고 불균질한 환경에서는 난류 구조가 더욱 불규칙하여 UAM과 같은 저고도 항공 운항체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대기경계층(ABL)은 지표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류권의 최하층으로 정의된다(Stull, 1988; Wallace and Hobbs, 2006). 맑은 날 육지에서 대기경계층은 명확한 일주기를 가지며 변화한다.
일출 이후 태양 복사에 의해 지표면은 단파복사로 가열되고, 이로 인해 지표면 인근의 대기가 난류로 가열된다. 일반적으로 대기경계층 전체 두께의 약 1/10에 해당하는 이 지표층(surface layer)의 열 기포(thermal)의 일부는 혼합층(mixed layer)을 넘어 자유대기(free atmosphere)로 침투한다. 온위가 일정한 혼합층과 약한 안정도를 갖는 자유대기의 사이에는 강한 안정도의 층이 있어, 지표층으로부터 상승한 강한 열 기포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 구체적으로 부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유대기로의 진입 정도가 결정된다. 자유대기로 진입한 열 기포는 어느 정도 높이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대기경계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자유대기를 일부 포함하여 돌아온다. 이러한 대기경계층과 자유대기의 공기가 섞이는 층을 유입 대(entraiment zone)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맑은 날 주간 대기경계층은 지표층, 혼합층, 유입대로 구성된다(Fig. 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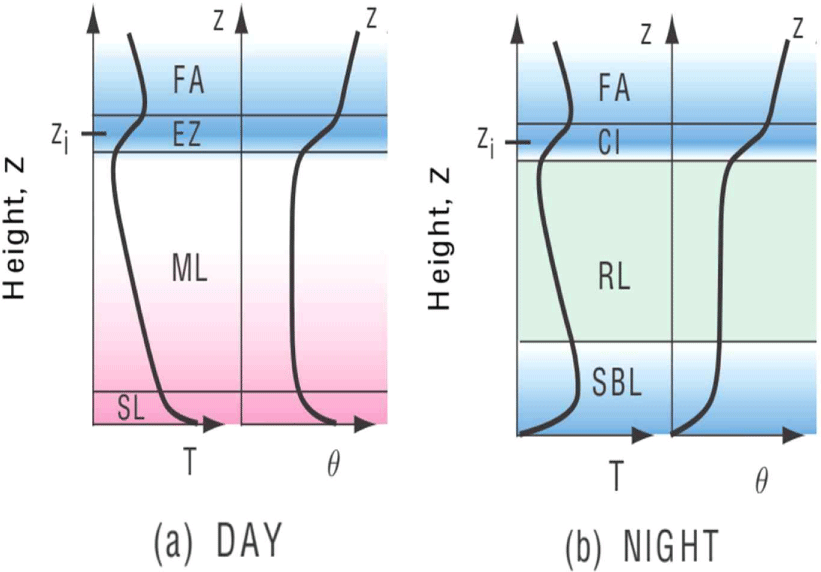
반면, 일몰 후에는 태양의 단파복사가 차단되고, 지표면은 지속적 장파복사를 통해 대기를 거쳐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로 인해 지표면 온도는 대기보다 낮아지고 안정층(stable boundary layer)이 형성되며, 야간 동안 점차 두꺼워진다. 안정층 상부에는 주간에 형성된 혼합층이 평균 구조는 유지되지만, 난류가 소멸된 잔여층(residual layer)으로 존재한다. 잔여층 위에 유입대는 평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열 기포의 자유대기 유입의 역할이 없이 강한 안정층의 구조만을 유지하고 있어, 덮개 역전층(capping inversion)으로 부른다. 즉, 맑은 날 야간 대기경계층은 안정층, 잔여층, 덮개 역전층으로 이루어진다 (Fig. 1 b).
이처럼 맑은 날 육지에서 주야간의 대기경계층 구조는 대기과학 교과서에 소개되는 대표적 이상 구조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구조는 관측된다. 예를 들어, 라디오존데를 통한 온도 및 수증기 연직 프로파일에서도 종종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교과서에 제시된 이상 구조만으로 대기경계층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예측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대기경계층 내를 비행하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 운항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단편적 개념은 매우 제한적이며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현실의 지표면 조건은 공간적으로 항상 비균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인 우리나라의 경우, 동서로 수백 km 규모의 육지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해양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곧 해양-육지-해양으로 이어지는 지표면의 불연속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육지 내부 역시 지형의 기복, 토양 및 식생의 분포, 토지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추가적인 비균질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표면의 비균질성은 열, 수분, 운동량의 전달 방식에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는 곧 대기경계층의 형성과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교과서적 개념은 대기경계층이 국지적인 지표 특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전날 강수로 인해 지표가 젖어 있는 경우, 수분 증발로 인한 잠열 플럭스(latent heat flux)는 증가하고, 현열 플럭스(sensible heat flux)는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기경계층의 발달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수증기 함량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가정은 지표 비균질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거나 오차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지표 비균질성의 규모가 주간 대기경계층의 높이보다 3∼4배 이상, 즉 대략 5km 이상일 경우에는 중규모 순환(mesoscale circul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해륙풍(sea–land breeze)이나 산곡풍(mountain-valley wind)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순환은 교과서적 수평 균질 조건 하에서의 난류와는 다른 성격의 난류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대기경계층의 연직 구조 또한 지표층의 미형성, 자유대기의 상이한 유입 방식 등의 원인으로 인해 기존의 교과서적 구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맑은 날씨가 아닌 구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대기경계층의 구조와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구름의 유무뿐만 아니라 구름의 유형과 위치에 따라 대기경계층 내 에너지 교환, 난류 구조, 열적 안정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교과서적 대기경계층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의 다양한 대기경계층, 특히 지표의 공간적 비균질성에 의해 유도되는 구조와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중규모 이상의 강한 지표 비균질성을 갖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평 비균질성 조건에서의 대기경계층 구조 및 난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기존의 대기경계층 연구는 주로 지표와 대기의 상호작용을 모사하기 위한 대기 모델의 물리 모수화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풍력 및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그리고 UAM과 같이 대기경계층 내를 비행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을 위한 기상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대기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량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미 UAM 관련 산업 및 정책 논의에서는 대기경계층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설정된 300∼600m 고도 범위의 회랑(corridor)은 교과서적 주간 대기경계층 구조상 혼합층에 해당하며, 난류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에는 난류가 거의 소멸된 잔여층이 해당 고도에 위치하므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결국 개념적 정의에 기초한 추정에 불과하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우선, Fig. 2에 제시된 대류경계층 고도로 정규화된 높이의 함수로 표현한 연직 속도 분산 ((w'2))프로파일 (대류 속도 규모 로 정규화함)을 살펴보면, 그 최댓값이 혼합층 중간보다 다소 아래 지점에서 나타난다. 그림에서 점선은 Lenschow et al.(1980)이 제시한 혼합층 상사성 곡선을, 기호는 동일 장소에서 여러 맑은 날 낮 시간대에 수행된 항공 관측 결과를 나타낸다(자세한 사항은 Kang et al., 2007 참조). 이는 지상 300∼600m의 도심항공교통 회랑 고도에서 상당한 연직 난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도심항공 교통 운항시 비행이 상당히 울퉁불퉁한 경험(bumpy experience)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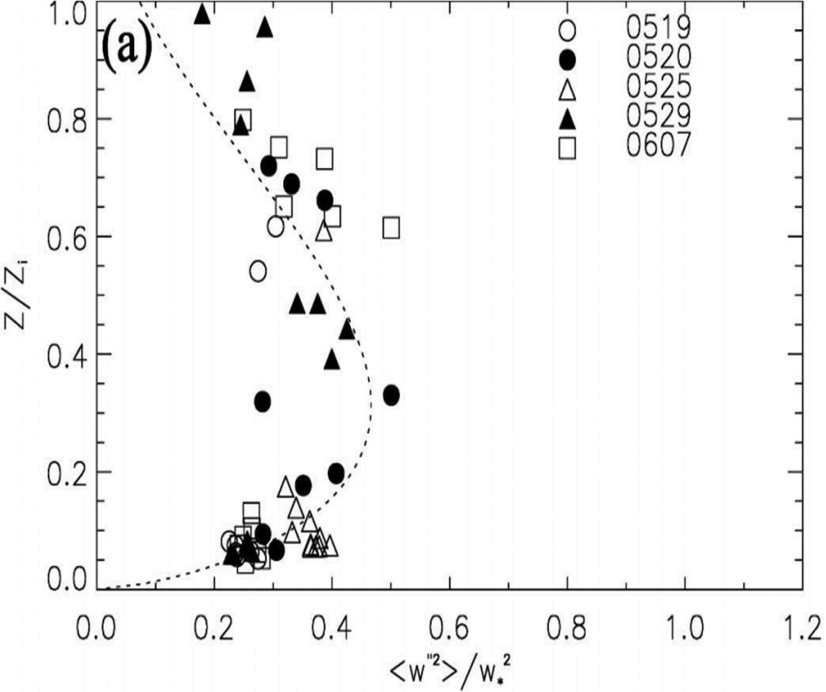
더 나아가, 지표의 강한 중규모 비균질성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이러한 교과서적 구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UAM이 운용될 각 지역의 고유한 지표 조건과 그로부터 유도되는 대기경계층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UAM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대기 조건 하에서의 지표–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 기반의 체계적인 연구와 그로부터 축적된 정보 기반의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대기 경계층에 대한 고도별 기상 관측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기상청에서는 주로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통해 지상 10m 고도의 기상 요소만을 관측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고도에 대해서는 일부 지정 지점에서 라디오존데 등을 활용한 제한적인 관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UAM 운항에 필요한 저고도 기상 자료 확보는 미흡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고도별 기상 정보는 수치예보모델에 기반한 예측값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경계층의 지상 및 항공 관측 사례를 통해 저고도 난류 특성을 분석하고, UAM 운항에 적합한 기상 정보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에 위치한 보성 종합기상관측탑(이하 보성관측탑)은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307.19m의 고층 기상탑으로(Fig. 3), 지표면부터 약 300m까지의 고도에서 연속적이고 고해상도의 기상관측이 가능하다. 특히 이 고도 범위는 도심항공교통의 운항 고도와 밀접하게 일치하며, 대기경계층 내 난류 특성을 실측할 수 있는 중요한 관측 기반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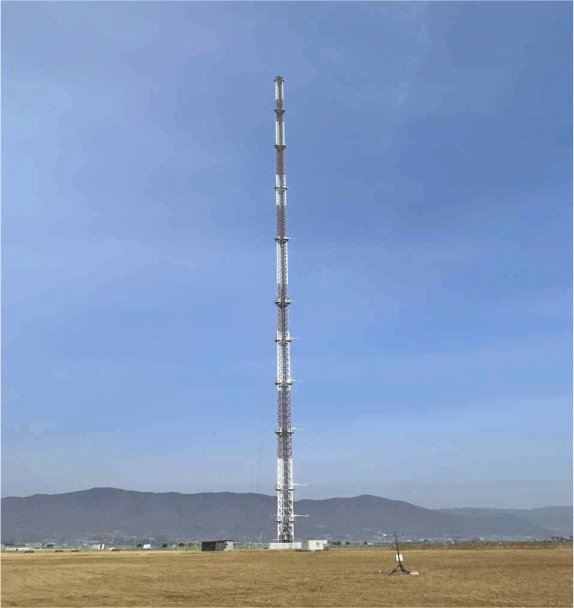
보성관측탑은 총 11개 층(10, 20, 40, 60, 80, 100, 140, 180, 220, 260, 300m)에서 1분 간격으로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이 관측되며(Fig. 4), 이 중 지표를 포함한 4개 층(0, 60, 140, 300m)에서는 20Hz 해상도로 연직 바람 성분, 소닉 온도,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 농도 등의 고해상도 플럭스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NIMR, 2014). 또한 보성관측탑은 남해안에 가까운 간척지 기반의 평탄한 지형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고도가 낮고 인공 구조물이 적어 외부 교란이 제한된 관측 환경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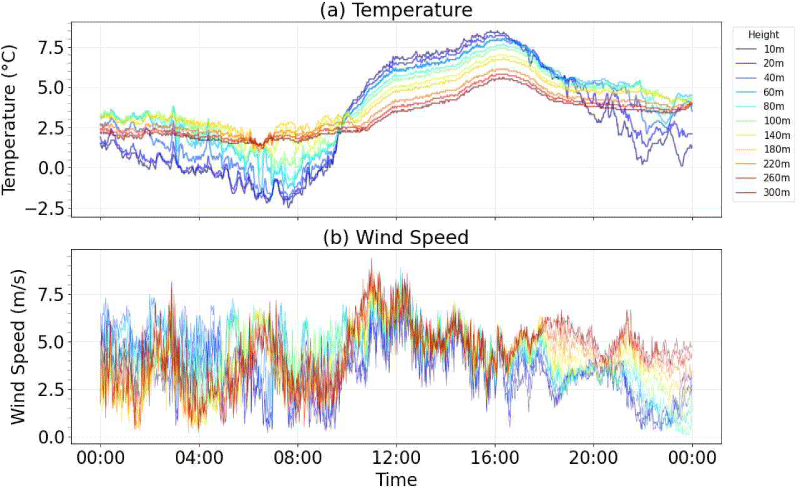
이러한 고해상도 관측 체계는 플럭스와 기본 기상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난류 및 에너지 교환 분석은 물론, 연직 구조 변화나 일·계절 변화와 같은 다양한 대기경계층 특성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Park et al., 2014; Hwang et al., 2015).
또한, 보성관측탑의 입지 특성은 해풍·육풍 순환, 해양성 기단 유입, 복사 가열, 해안 안개 등 미기상 현상에 의한 경계층 변화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관측 조건을 제공한다 (Lim and Lee, 2019; Hwang et al., 2020). 특히, 보성관측탑의 연직 관측자료는 하층 대기의 난류 구조를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UAM) 운항 시 고려해야 할 기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저고도에서의 난류 강도, 안정도, 에너지 플럭스 등은 UAM의 비행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해상도·장기 관측자료는 다양한 운항 조건에 대한 기상 위험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예측 모델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다.
UAM 운항고도에 해당하는 300∼600m 고도 구간에서의 항공 난류 특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제 소형 고정익 항공기(Cessna 172)를 활용한 항공기 진동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행 실험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일대에서 수행되었으며, 그림에는 비행 경로와 순항 중 난류를 조우한 지점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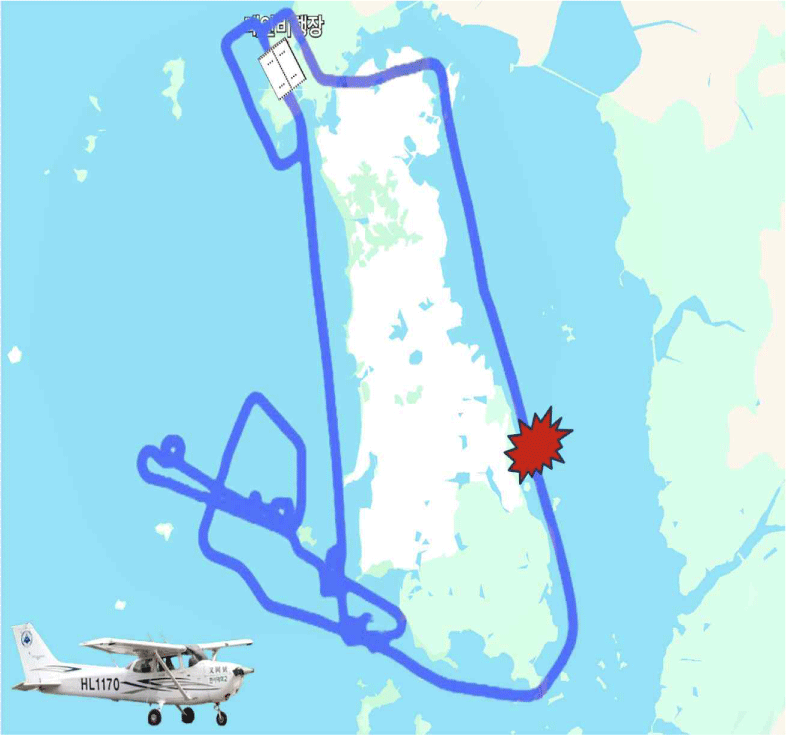
항공기에는 고정밀 3축 가속도계인 Sanlian사의 palert network acclerometer를 탑재하여 연직 가속도(G, gravity)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데이터는 100Hz의 주파수로 수집되었다.
기록된 연직가속도 자료는 난류에 인한 연직 방향 진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을 수행하였다. FFT는 시간 영역의 진동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특정 대역의 진동 에너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진동으로 알려진 1에서 10Hz 범위의 파워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ISO 2631-1 기준에 따라 인체의 생리적 반응(예: 불쾌감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탑승자의 체감 품질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공 난류에 의한 진동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Mansfield and Aggarwal, 2022).
항공기의 진동 주파수 구성(frequency content)을 분석함으로써 저고도 운항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 난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형, 해륙풍 등 다양한 국지적 요인이 중첩되는 대기경계층 내의 UAM 운항 환경에서 이러한 분석은 탑승자의 쾌적성과 운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실험 비행 당시(2023년 12월 19일)의 기상청 관측 자료 확인 결과 비행 경로 부근의 지상풍은 1m/s 내외로 약했으나 13시 20분경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기체 흔들림이 감지되었다. 이 시각의 진동 데이터의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연직 가속도 값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과 1∼10Hz 대역의 FFT 파워값이 인근 시간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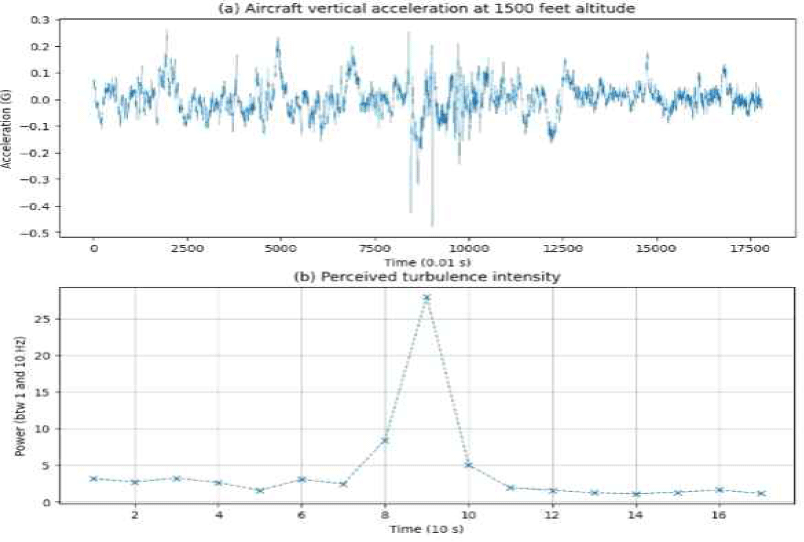
이는 탑승자가 지각한 난류 강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파워스펙트럼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Fig. 7). 실험 비행일의 기상은 양호한 편으로 항공기는 비행장으로 복귀 시 약 100kt 의 속도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쾌적한 비행 중이었으나, 본 사례의 진동 특성은 앞 절(대기경계층)에서 언급한 ‘UAM 회랑 고도에서의 상당한 연직 난류 (울퉁불퉁한 비행, bumpy experience)’가 발생한 사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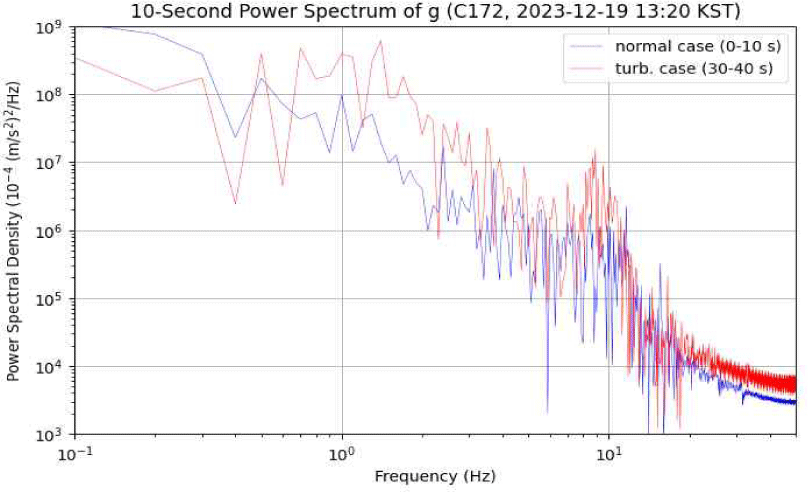
위 항공 관측 결과는 저고도 난류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UAM 운항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지 기상 조건에서의 여러 실증 기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기경계층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항공기 난류 지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대기경계층의 난류 특성은 고고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제시되어 고고도 항공항행에 사용되는 난류 지표들, 예를 들어 EDR, Ellord index 등을 대기경계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재고하고, 대기경계층 특성에 맞는 난류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EDR은 고고도 국제항공항행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난류 지표이다. 고고도 항공에서 EDR을 난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항공기의 흔들림을 유도하는 난류의 규모가 대부분 관성 범위(inertial range) 안에 있기 때문이다. 관성 범위는 생성된 난류 에너지가 작은 규모로 전달되는 구간으로, 난류 길이 척도(turbulence length scale)가 관성 범위의 상한을 나타낸다. 관성 범위 내의 난류 특성은 콜모고로프 이론(Kolmogorov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특정 규모에 해당하는 난류 강도는 EDR에 비례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고고도 청천난류의 경우 난류 길이 척도가 수백 m∼수 km로 상대적으로 크고 변동성이 작으므로 이러한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잘 적용된다(Sharman et al., 2014).
그러나 대기경계층에서는 난류 길이 척도가 고고도에 비해 작으며 시공간에 따라 급격히 변동한다. 지표 근처와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는 길이 척도가 수 m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UAM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난류 규모가 관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기경계층에서는 난류의 비대칭성과 비균질성으로 인해 관성 범위가 잘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Chu et al., 2025).
이러한 상황에서 EDR을 난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난류 강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경계층 내에서는 EDR보다는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 TKE)가 난류 강도를 나타내는데 더 적절한 지표일 수 있다. EDR이 난류의 소산이라는 물리적 과정에 기반하였다면 TKE는 난류 변동성의 통계적 크기를 나타내므로 난류 강도와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난류 에너지 소산율 ɛ(EDR의 세제곱에 해당)과 TKE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Stull, 1988).
여기서 L은 난류 길이 척도이다. 위 식 (1)을 통해 대기경계층의 난류 길이 척도 변동에 따라 EDR이 실제 난류강도를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TKE는 평균 풍속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으로 정의되므로, 평균을 취하는 시공간 범위(적분 스케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포함되는 난류 변동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UAM 기체에 흔들림에 영향을 주는 난류 변동성의 시공간적 규모를 관측하고 이에 기반한 난류 운동 에너지 계산법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진보된 난류 지표는 난류 규모별로 UAM 기체 흔들림과 난류 변동성과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UAM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모의 난류 변동성에 기체 흔들림 영향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적분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UAM 운항 지역의 난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울산 UAM 실증지2)를 중심으로 고해상도 기상모델인 WRF-LES를 수행하여 난류 특성을 분석하였다.
WRF-LES는 WRF 모델(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을 큰 에디모사(large eddy simulation; LES) 모드로 운용하는 것으로 관성 범위 일부를 포함한 큰 규모의 난류 소용돌이를 격자 상에서 해석하므로 경계층의 3차원 난류 구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다(Skamorock et al. 2019). 모델의 도면은 울산 UAM 실증지 버티포트 예정지 좌표를 중앙으로 하고 1.5km, 300m, 100m 해상도로 상세화되는 3개의 중첩 도면을 사용하였다. 최외각 도면은 중규모 모델 세팅, 안쪽 2개의 도면은 LES 세팅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도면은 수평 150×150개, 수직 70개 격자로 구성하였다. 이 외 모델의 물리 과정 및 상세 설정은 “UAM 특화 고해상도-초단기 기상 예측 모델 설계 기술서”에 기술되어 있다. 2022년 6월∼2023년 5월 기간 동안 WRF-LES 과거 모의를 수행하여 버티포트 위치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TKE는 10분 시간 평균에 대하여 계산되었으며 격자 크기보다 작은 규모의 난류 에너지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EDR은 고고도 항행에서 이용되는 윈드시어 또는 Ellord 기반의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고 LES에서 물리적으로 계산되는 난류 에너지 소산율에 기반하여 계산되었다.
버티포트 상공 난류 특성(TKE, EDR, 수직윈드시어 VWS)의 일변화를 보면(Fig. 8), 낮 동안 평균적으로 약 1,200m 고도까지 경계층이 발달하여 TKE가 증가하고, 야간에는 경계층 하부의 윈드시어가 강한 특성을 보인다. 주간에는 TKE가 높고 EDR이 낮은데 이는 난류 길이 규모가 큰 부력에 의한 난류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야간에는 TKE가 상대적으로 낮고 EDR이 높은데 이는 난류 길이 규모가 작은 시어에 의한 난류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계층 내에서 TKE와 EDR은 대기 안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EDR은 윈드시어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나 주간에 대류로 인한 난류 에너지 증가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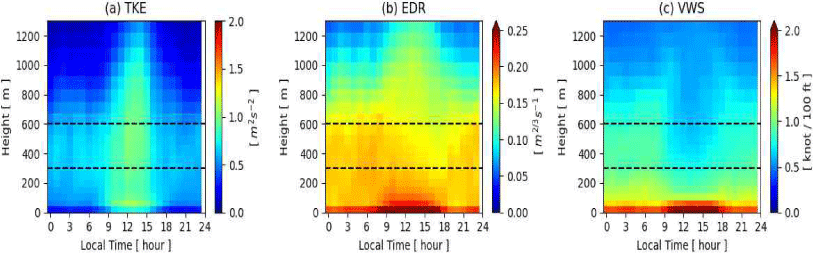
버티포트 상공 TKE와 EDR의 산점도를 그려보았을 때 두 난류 지표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Fig. 9). 특히, 경계층 하부에서 EDR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TKE에 비해 난류 강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계층 상부에서는 EDR이 대류로 인한 난류 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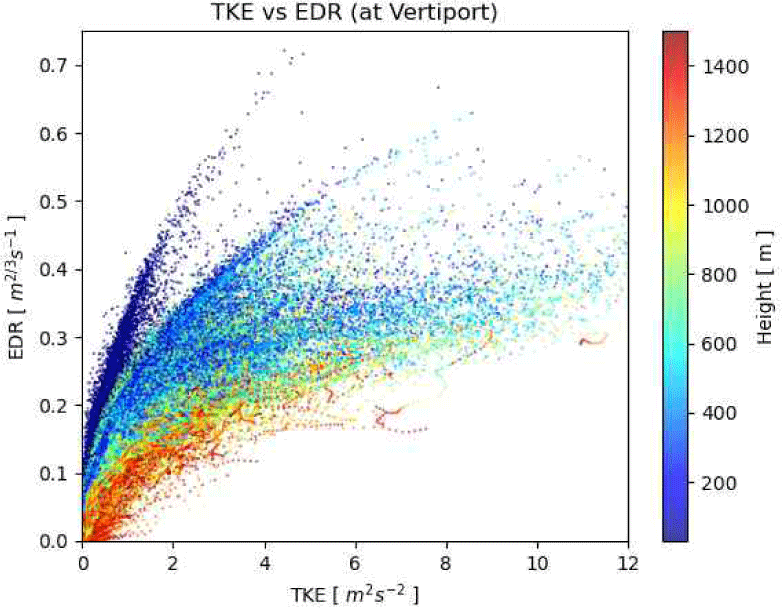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향후 UAM 운항과 대기경계층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난류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AM의 운항 고도에 해당하는 대기경계층 내 항공 난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 난류의 개념과 주요 분류, 대기경계층의 구조적 특성, 난류 측정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대기경계층에서 활용 가능한 난류 지표와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항공 난류는 발생 메커니즘과 위치, 구름 유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특히 저고도 환경에서는 기계적·열적 난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대기경계층은 주야간의 복잡한 열적 구조뿐 아니라, 지표의 공간적 비균질성, 해륙풍과 같은 중규모 순환 등으로 인해 단순한 이상 구조로는 설명이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복잡성은 난류의 발생과 전개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UAM 운항 환경에서 안전과 승객 탑승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보성 관측탑 사례를 통해 고해상도 연직 관측을 기반으로 대기경계층의 난류 강도, 에너지 플럭스, 안정도 등이 시간대와 배경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UAM 운항 시 중요한 기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 소형 항공기를 활용한 항공 관측 사례에서는 저고도 운항 중 발생하는 난류의 실제 특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UAM 운항 고도에 적합한 난류 지표 개발과 체계적인 검증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대기경계층에서의 UAM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난류 지표의 이론적 배경과 UAM 실증지의 난류 특성에 대한 고해상도 기상모델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EDR 지표가 대기경계층의 비대칭성, 비균질성, 난류 길이 척도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실제 난류 강도를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성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저고도 환경에서는 보다 물리 기반의 대안 지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경계층과 UAM 운항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항공 난류 지표에 대한 기초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상 및 운항 조건에서 UAM 운항에 미치는 난류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대기경계층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난류 지표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 난류 측정을 포함한 실증 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고해상도·장기 관측자료와 실제 항공 운항 데이터의 융합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운항 조건에서의 기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경계층의 특성과 UAM 운항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시간 기상 지원 체계로의 연계를 고려한 운용 지침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