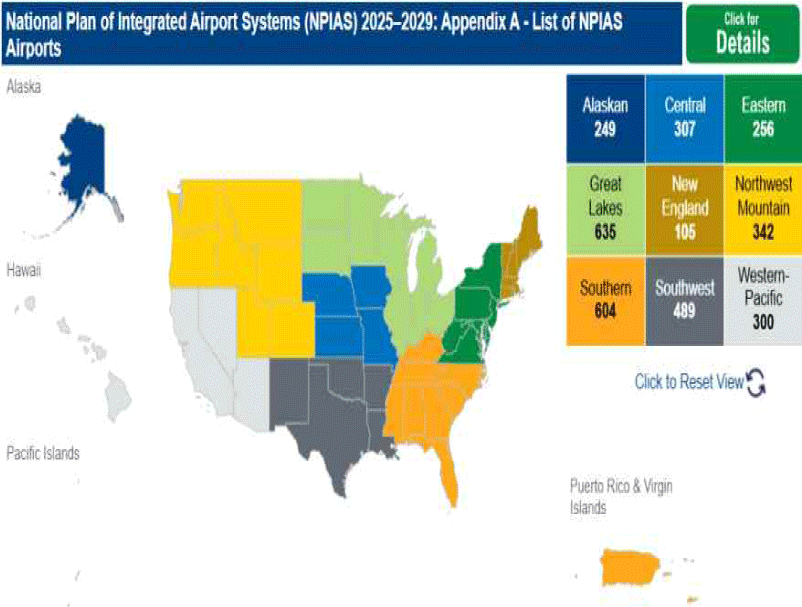Ⅰ. 서 론
지난 20여 년간 국내 항공시장은 규제 완화와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한 비용 중심의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사의 시장 진입과 퇴출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공항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항공 네트워크는 여객과 화물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수천 개의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나, 그 구조는 여전히 특정 지배적 공항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네트워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Grubesic et al., 2008). 이들 공항은 전체 항공 흐름에서 출발지·목적지·경유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성공 여부는 운영자의 역량뿐 아니라 지리적 입지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항공 자유화, 연료 가격 변동, 전염병(COVID-19)과 같은 세계적 사건은 네트워크의 구조와 공항 간 위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항 위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화, 경제지리, 지역경제 재편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활성화는 항공사들의 전략적 선택과 승객 유치 경쟁에 크게 좌우되며, 이 과정에서 공항 간 경쟁은 국내를 넘어 인접 국가 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공항 정책과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 공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항 분류는 ‘중추공항’, ‘거점공항’, ‘지방공항’, ‘국제공항’, ‘일반공항’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 수요지표나 국제적 기준보다는 정책적 판단과 관습적 배경에 의존하는 경우로 사료된다. 그 결과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위계가 고착화되고, 불균형한 정책 지원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공항이 지역 경제, 교통, 관광, 물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반면 항공 선진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공항 위계를 여객 수, 운항 횟수, 연결성(connectivity)과 같은 정량적 지표에 기반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공항 발전 단계에 따른 차등적 지원과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항공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항 위계 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항공 선진국의 공항 분류 기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 기준에 기반한 공항 위계 체계의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새롭게 개정된 Regulation (EU) 2024/1679를 통해 TEN‑T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범유럽 교통 네트워크(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는 유럽연합(EU)이 유럽 전역의 사람과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계획·건설·연결 중인 범유럽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네트워크이며, 항공, 육로, 철도, 항만, 복합운송 등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며, 경제·사회적 통합 및 지속가능한 이동성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교통인프라를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 확장 코어 네트워크(extended core network), 포괄적 네트워크(comprehensive network) 세 단계로 체계화하고, 공항 지점의 위계 배치 및 시기별 완성 목표(2030 코어, 2040 확장 코어, 2050 포괄적 네트워크)를 설정했다.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의 공항 위계는 목적별로 공항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승객 숫자를 규정함으로서 공항의 위계를 정의하고 있다. Table 1은 이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는 집행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보다 실무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감독하기 위해 더욱 단순하고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다. Table 2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항위계 기준을 설명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이용 승객수에 따라 정량적 기준으로 위계를 부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Regulation(EU) 2024/ 1679와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은 모두 EU의 교통정책 수립과 공항 위계 설정에 관여하지만, 법적 성격과 역할, 구체성, 적용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EU)은 범유럽 교통 네트워크(Trans 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의 위계 설정과 인프라 개발을 위해 Regulation(규정)과 Guidelines(지침)이라는 상호 보완적 장치를 운영한다(Table 3). Regulation (EU) 2024/1679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구속력 있는 법령으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교통 노드의 선정 기준과 핵심망 구축 시한을 명확히 제시한다. 즉, Regulation은 TEN-T 정책의 법적 토대이자 회원국 이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규정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권고 기준으로 기능한다. 특히 연간 여객 수와 항공편 수와 같은 절대적 수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높인다. 예컨대 Regulation이 “EU 전체 여객의 0.1% 이상”이라는 상대적 비율 기준을 제시한다면, Guidelines는 이를 “연간 여객 90만 명 이상”과 같이 구체화한다. 따라서 Regulation은 법적 정합성을 보장하고, Guidelines는 실무 실행력을 보완함으로써 EU 차원의 교통 계획이 제도적 안정성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한다.
Category C, D 공항은 항공사 유치 보조금, 공항 운영비 지원 등이 허용되고, Category A 공항은 경쟁 중립성 원칙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제한된다. Category B 공항(National Airports)은 EU 정책상 국가 단위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초대형 허브는 아닌 공항으로 분류하며, 공항 인프라(활주로, 유도로, 터미널) 확장 보조, 공공 서비스 목적(PSO) 항공편의 운항 비용 일부 보조 및 지속가능성 전환 관련 투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Category A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많지만 항공사 유치 보조금은 제한적이다.
이 자금은 EU가 교통, 에너지,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EU 공동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CEF 자금은 특히 TEN-T Core 및 Comprehensive 네트워크에 속한 공항·항만·도로·철도 등 인프라에 직접적인 보조금 및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TEN-T의 Core Network에 속한 대형 공항을 우선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하며, 다중 교통수단 연결성(공항-철도-항만)을 갖춘 공항에 고속도로·철도 연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항공이용자가 많은 미국은 2024년 기준 약 8억7천만 명의 승객이 항공편(국제, 국내선 포함)을 이용했는데, 국가통합공항시스템계획(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s)은 시스템에 포함된 약 3,287개 공용 공항의, 현재 수행하는 역할과 향후 5년 동안 공항 개선 프로그램(AIP)을 통해 연방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항개발의 규모와 유형을 구별하고 있다(Table 4).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5년 단위의 공항 개선 프로그램(AIP) 자금지원이 가능한 개발 예산을 2년마다 보고서로 발간·갱신하고 있다. 미국의 공항은 FAA에 의해 연간 10,000명 이상의 여객을 처리하는 Primary airport와 그 이하인 Non Primary airport로 구분하고 있고 Primary airports는 상업서비스를 제공하고, Non Primary arports는 주로 개인 항공기나 비상업 항공기를 처리한다. Primary Airport는 미국내 여객의 1% 이상을 처리하는 Large Hub, 여객의 0.25%∼1%를 처리하는 Medium Hub, 여객의 0.05%∼0.25%를 처리하는 Small Hub, 여객의 0.05% 미만을 처리하는 지역중심의 소규모 공항인 Non Hub로 구분하고 있다.
FAA는 공항을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연간 이용객 수, 항공기 운항 횟수, 경제적 중요성, 공공 접근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한다. 상업서비스 공항(commercial srvice arports)은 연간 2,500명 이상의 상업 항공 승객을 처리하는 공항, 주요 허브(Major Hub), 중형 허브(Medium Hub), 소형 허브(Small Hub), 비허브(Non Hub) 공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체 공항(Reliever airports)은 주요 상업 공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공항으로서 일반항공(General aiation) 항공기, 경량 항공기 등을 수용하여 상업 공항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일반항공 공항(General aviation arports)은 상업 항공 운항이 아닌 개인, 기업, 교육, 응급의료, 농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항을 의미한다. FAA는 일반항공 공항을 이용률,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더욱 세분화, 이러한 기준을 통해 FAA는 공항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공항 시스템(NPIAS)의 관리 및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항 위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NPIAS는 어떤 공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얼마의 개발이 필요한가?를 제시하는 국가공항종합계획으로 이해하면 되며, AIP는 그 계획에 따라 어떤 공항 프로젝트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실행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NPIAS가 설계도라면 AIP는 실제 건설비용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공항의 위계를 정하는데 있어 명확히 승객 이용률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Table 5와 같이 기준에 해당되는 공항의 위계를 분류하고 있다. 근거에 의해서 분류된 공항들은 위계를 부여받고 그에 준하는 국가지원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데. 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s (NPIAS)은 미국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수립한 국가 차원의 공항 개발 계획이며. 미국 내 공항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자금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금액(USD) | 지원범주(약 $675억) |
|---|---|
| 224억 | 공항 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재활/재건 |
| 222억 | 터미널 시설 개선 |
| 122억 | 설계 기준(design standards) 충족 |
| 38.4억 | 공항 수용력 증대 |
| 17.6억 | 안전 관련 프로젝트 |
| 14억 | 지상 접근성 개선(교통망 개선) |
| 기타 | 관제탑(ATC), 보안, 환경보호, 소음 저감, 신규공항 등 |
미국은 공항마다 이용객 수에 따른 위계를 지정하여 연방공항개선 프로그램(API, Airport Improvement Program)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항을 지정하고 적절한 자금을 배당하고 공항 시스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 하는데 지역공항, 대형 허브공항, 일반항공공항 등이 균형 있게 개발되도록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FAA는 매 2년 마다 NPIAS를 갱신하여 항공산업의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공항의 위계(Hierarchy)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 정책, 예산, 인프라 계획, 안전 규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은 미국 NPIAS에 포함된 공항의 분포와 개수를 지역별로 나타낸 것인데 NPIAS에 포함된 공항은 연방 자금 지원(공항개선프로그램, AIP) 대상이 되며, 미국공항망(국가통합공항시스템)의 핵심을 형성한다.
미국 FAA(연방항공청)가 NPIAS(국가 통합 공항 시스템 계획)를 통해 공항 위계를 세분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항 크기별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예산·인프라 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다. 연방정부가 공항 개선 프로그램(AIP, Airport Improvement Program)을 통해 자금을 배분할 때, 모든 공항에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승객 수·운항 횟수·지역 기여도 등 정량적 기준으로 위계를 부여하여, 필요성과 영향력이 큰 공항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륙 규모의 국가로, 대형허브, 중소공항, 일반항공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위계 구분을 통해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국내선·국제선 연결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지원측면에서 위계 체계는 단순히 대형 허브 육성이 아니라, 지역 공항의 역할 보장에도 목적이 있는데, 지역의 중소공항에도 위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 접근성, 관광·물류 기반, 응급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는 대형 허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막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공항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정책·규제·안전 관리 기준측면에서 FAA는 위계 체계별로 안전·보안 규제 수준과 시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Large Hub 공항은 국제 기준(ICAO)에 맞춘 첨단 보안·관제 체계가 필요하지만, General Aviation 공항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규정 적용한다.
즉, 위계는 곧 규제 강도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FAA는 2년마다 NPIAS를 갱신하여 수요 변화·기술 발전·경제 상황에 맞게 위계 체계를 조정함으로서 빠르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력적인 국가 공항 정책을 운영하고, 변화하는 항공 수요, 저비용항공사(LCC) 확대, e-commerce 물류 증가, UAM/UAS 도입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통합 공항 시스템 계획(2022)에 포함된 공항은 3,295개인데기존 공항(existing) 3,287개와 향후 개통 예정인 신규 공항(proposed) 8개가 포함되어 있다. 2022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23∼2027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국가통합공항시스템계획(NPIAS, 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s)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FAA는 공항개선프로그램(AIP, Airport Improvement Program)과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한 약 18,700개의 공항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약 674억 달러의 개발 수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전 보고서(2022) 대비 약 49억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FAA가 제시한 예산은 범주별로 공항 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재활/재건, 터미널 개선, 설계 기준(design standards) 충족, 공항 수용력 증대, 안전 관련 프로젝트, 지상 접근성 개선, 관제탑(ATC), 보안, 환경 보호, 소음 저감 등이다. 미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항에 대한 개발 및 개선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그 예산은 현재 환율로 약 94조 원을 초과한다.
국제공항연합-유럽(Airport Council International/ACI Europe)은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 ACI는 비영리 국제민간단체인데, 전 세계 공항 운영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공항 산업의 발전·안전·환경·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협력하여 공항 관련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전, 보안, 환경, 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공공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세계 공항의 여객·화물·항공기 운항 실적을 집계하고 발표하며. 시장 분석 보고서, 항공 수요 예측, 산업 동향 자료를 발간한다.
공항의 위계를 연간 승객처리량을 기준으로 공항을 분류하며, Major airports, Mega airports, Large airports, Medium airports, Small airports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은 저비용항공사와 관광 중심의 지역공항이 많아 소형공항(small airport)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간 승객 수 100만명 미만의 공항을 의미한다. ACI Europe 기준에 따르면 Major airport는 연간 4천만명 이상의 승객을 처리하는 공항으로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등 유럽 항공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를 뜻하고, Mega airport는 연간 2,500만∼4000만 명을 처리하는 뮌헨, 로마등 유럽 내 중거리 및 일부 대륙간 연결하는 주요공항. Large airports는 연간 1천만∼2,500만 명을 처리하는 취리히, 비엔나등 주요 관광도시 및 지역 허브 공항이며, Medium airports는 연간 100만∼1천만 명을 처리하는 공항이며, Small airports는 연간 100만 명 미만의 승객을 처리하는 공항으로 주로 지역 주민과 소규모 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공항이다. Table 6과 같이 ACI Europe도 이용 승객수를 기준으로 공항의 위계를 분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다른 어떤 기준보다 간결하게 객관적 정량 지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일본의 체계는 1956년 제정된 「공항법」(법률 제80호)을 기점으로 제도화되었다. 당시에는 공항을 제1종, 제2종, 제3종 공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주로 운영 주체와 관리 책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제1종 공항은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대형 공항으로, 국제선과 국내선의 주요 거점을 담당하였다. 제2종 공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항으로, 국내선 중심의 지역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제3종 공항은 군사시설과 민간 항공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와 같이 초기 체계는 국가–지방–군사라는 운영 주체의 구분을 중심으로 공항 위계를 설정하였다(Shibata, A. 1999).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과 항공 수요 급증으로 공항 건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1·2·3종이라는 단순한 구분은 점차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1978년 개항한 나리타 국제공항과 1994년 개항한 간사이 국제공항은 민간 자본과 공기업 형태가 결합된 새로운 운영 모델로 등장하였고, 이는 기존 제1종 공항 체계에 포함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2005년 개항한 중부 국제공항(센트레아) 역시 민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면서, 종래의 삼분법적 구분은 제도적 한계를 보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는 기존의 분류 체계를 현실적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2008년 「공항법」 전면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제1·2·3종 공항 구분은 폐지되고, 거점공항(拠点空港), 지방관리공항(地方管理空港), 공용공항(共用空港), 기타 공항이라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다(Airport Act, 2008). 거점공항은 국가적·국제적 항공 네트워크의 중심 공항으로, 다시 국가 관리 공항, 회사 관리 공항, 특정 지방 관리 공항으로 세분화 되었다. 지방관리공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중소 규모 공항으로 규정되었으며, 공용공항은 민간 항공과 자위대·주일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Black, 2022).
2008년 개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운영 주체의 다양화와 재정 책임의 분담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전환점이었다. 즉,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리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항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군사·안보적 필요성을 제도 속에 반영함으로써 일본 특유의 민군 병용 관리 모델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 전략, 지역 균형 발전, 국제 경쟁력 강화, 안보 체계 유지라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시설임을 반영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공항 위계 분류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국가 항공정책과 교통인프라 전략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첫째, 국가, 민간기업, 지방정부, 군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일본의 제도적 환경에서 운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대형 국제 허브 공항은 민간 투자와 국가 재정을 결합하여 운영하고, 중형 규모 공항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소규모 지역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킨다. 셋째, 산악 지형과 도서 지역이 많은 일본의 국토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허브–지역거점–소규모 지역 공항이라는 위계 구조를 통해 전국적 교통망의 균형적 연계성을 확보한다. 넷째, 자위대와 주일미군 기지가 전국적으로 분포한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민간 항공과 군사 운용이 공존할 수 있는 공용 공항 범주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적 필요와 민간 항공 수요를 제도적으로 조율한다(Airport Act 2008). 끝으로, 거점공항은 국제선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공항은 관광과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중적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요컨대, 일본의 공항 위계 분류는 운영 주체의 명확화, 재정 책임의 배분, 국가 교통망 최적화, 군사·안보 조율, 국제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다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본의 공항 위계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을 넘어, 재정 지원의 차등적 배분 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국가 관리 공항과 지방 관리 공항은 국제선 유치 및 지역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착륙료 감면 혜택을 받으며, 국가 관리 공항의 경우 착륙료가 최소 50% 이상 할인되고, 지방 관리 공항은 인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보조된다. 또한, 공항 시설 확충과 운영권 이전과 관련하여 무이자 대출 및 납부 유예 제도가 활용되며, 예컨대 홋카이도 공항은 연간 26억 엔, 후쿠오카 공항은 연간 153억 엔 규모의 운영권 대가 납부가 유예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공항정비 특별회계를 통해 2021 회계연도 기준 약 5,280억 엔을 공항 관련 사업에 투입하였으며, 이 중 2,687억 엔이 대도시권 거점공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다(Japan MLIT, 2021). 이러한 지원 구조는 일본의 공항 위계 체계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국제 경쟁력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소수의 대형 항공사가 운영하며 엄격한 규제를 받았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내 항공시장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현재 저비용 항공사가 9개, 대형항공사가 2개로 총 11개의 항공사가 활발히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운송하고 있고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세계 항공시장에서 뚜렷한 성공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항의 위계를 1995년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부터 적용, 위계 체계는 없으나 김해공항을 제2국제관문공항으로 개발한다고 표현하였다.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1995∼2000)과 같이 전국을 수도권, 영동권, 중부권, 호남권, 경북권, 부산권, 제주권의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위계 체계를 기존의 국제공항, 거점공항, 지방공항에서 인천공항 중심의 중추공항, 관문공항, 지방거점공항, 지방공항으로 세분화 한 바 있으며,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에서는 권역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제주권의 4개 권역으로 축소하고, 위계 체계를 중추공항, 거점공항(대형/소형), 일반공항으로 구분하였다. 아쉬운 점은 제3차에서 관문공항으로 지정되었던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정책당국 스스로 각 공항에 대한 성장의지를 포기하였다. 위계는 단순한 명칭이나 등급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정책적 의지와 행정 지원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점으로 사료 된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이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5∼2020)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까지 전국을 4개 권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 각 권역의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위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 공항과 신규 공항과 미래 공항 수요를 포함하여 위계를 정비한데 차이가 있었으며, 2024년 현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에 따라 국내공항을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체계와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의 위계 체계로 분류되어 있다(Table 7).
| 구분 | 중부권 | 동남권 | 서남권 | 제주권 |
|---|---|---|---|---|
| 중추 | 인천 | - | - | - |
| 거점 | 김포,청주 | 가덕(김해), 대구 | 새만금, 무안 | 제주 (제2공항) |
| 일반 | 원주, 양양 | 울산, 포항, 사천, 울릉 | 광주, 여수, 군산, 흑산 | - |
그러나 가덕신공항은 김해공항과 함께 동남권의 거점공항으로 검토되고 있어 국제선 공항과 이용객 1,700만 명(2024년 김해공항 기준)의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위계 수준이다. 거점공항은 Table 8에 정리되었듯이 권역의 국내선 수요와 중단거리 국제선만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적어도 인천공항에 준하는 중추공항은 아니더라도 준중추공항 또는 관문공항 수준의 위계는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점공항의 수준에 대해 경상권의 전문가들은 아쉬움이 많다. 연간 이용객이 천만 명이 넘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 소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청주, 무안공항과 동일한 거점공항의 위계로 분류되는 것은 공항의 역할, 투자, 정책지원 등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며, 특히 김해공항은 국제선 승객만 9백만 명을 상회하고 향후 가덕신공항의 건설로 위계가 연계될 것을 예상하면 거점공항의 위계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9는 차수별 공항개발계획으로서 공항 위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1, 2차에서는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제3∼5차까지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제6차 계획에서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
| 구분 | 성 격 | 세부 기능 |
|---|---|---|
| 중추 공항 |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 전세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의 허브 |
| 거점 공항 | 권역 내 거점 | 권역의 국내선 수요 및 중단 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 |
| 일반 공항 | 주변지역 수요담당 | 주변지역의 국내선 수요 위주 처리 |
| 구분 | 공항 위계 |
|---|---|
| 제 1 차 |
공항별 위계 지정없이 국제공항, 권역거점공항 및 지역공항으로 “위상”분류 *김해공항을 ‘제2국제 관문 공항’으로 개발 및 미주, 구주노선 취항이 가능한 시설 확충한다고 명시 |
| 제 2 차 | 중추, 관문, 지역거점, 지방, 기타 | |||||||
| 위계 | 수도권 | 부산권 | 중부권 | 경북권 | 호남권 | 영동권 | 제주권 | |
| 중추 | 인천 | - | - | - | - | - | - | |
| 관문 | 김포 | 김해 | - | - | - | - | 제주 | |
| 지역거점 | - | - | (청주) | 대구 | 무안 | 양양 | - | |
| 지방 | 기타* | 기타 | 별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개발 | |||||
| 제 3 차 | 중추, 대형거점, 소형거점, 일반 | |||||
| 위계 | 중부 | 동남 | 서남 | 제주 | ||
| 중추 | 인천 | - | - | - | ||
| 거점 | 대형 | 김포 | 김해 | - | 제주 | |
| 소형 | 청주/양양 | 대구/울산 | 광주/여수/ (무안) | - | ||
| 일반 | 원주 | (울진)/포항/사천 | 군산/(김제)/목포 | - | ||
| 제 4 차 | 중추, 거점, 일반 | ||||
| 위계 | 중부 | 동남 | 서남 | 제주 | |
| 중추 | 인천 | - | - | - | |
| 거점 | 김포/청주 | 김해/대구 | 무안 | 제주 | |
| 일반 | 양양/원주 | 울산/포항/ 사천 | 광주/여수/ 군산 | - | |
| 제 5 차 | 중추, 거점, 일반 : 제4차 계획과 동일 | ||||
| 위계 | 중부 | 동남 | 서남 | 제주 | |
| 중추 | 인천 | - | - | - | |
| 거점 | 김포/청주 | 김해/대구 | 무안 | 제주 | |
| 일반 | 양양/원주 | 울산/포항/ 사천/울릉 | 광주/여수/ 군산/흑산 | - | |
| 제 6 차 | 중추, 거점, 일반 : 제4차 계획과 동일 | ||||
| 위계 | 중부 | 동남 | 서남 | 제주 | |
| 중추 | 인천 | - | - | - | |
| 거점 | 김포/청주 | 가덕 (김해)/대구 | 새만금/무안 | 제주* | |
| 일반 | 원주/양양 | 울산/포항/사천/울릉 | 광주/여수/군산/흑산 | - | |
Ⅲ. 선행연구 고찰
기존 연구들은 공항의 위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기준과 분석 틀을 적용해 왔다. Bonnefoy et al.(2010)은 여객 교통량의 비중을 활용하여 공항을 주요 공항(primary airport)과 이차 공항(secondary airport)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여객의 1% 미만을 처리하는 소규모 공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교통량 집중도를 기준으로 공항 체계의 핵심–주변 구조를 밝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Derudder et al.(2010)은 공항을 지리적 규모에 따라 국가적·지역적·국제적 공항으로 분류하는 한편, 기능적 역할에 따라 허브 공항과 지배적 공항을 구분하였다. 이는 단순 여객 수가 아니라, 공항의 공간적 범위와 네트워크 내 위상을 고려한 분류 방식이다.
Brueckner et al.(2014)은 대도시권 내 공항 체계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은 국내 OD(출발–도착) 승객을 처리하는 공항을 주요공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권역 내 다른 공항들을 핵심(core)과 주변(fringe) 공항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대도시권 다공항 체계(multi airport system)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접근이다. Sun et al.(2017)은 여객 수를 기준으로 주요 공항(200만 명 이상), 이차 공항(10∼200만 명), 삼차 공항(10만 명 이하)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절대적 여객 수치를 활용한 단순한 계량적 분류이지만, 규모별 공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실용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공항 위계 분류는 교통량 비중, 지리적 범위, 기능적 역할, 대도시권 내 다공항 체계 분석, 절대 여객 수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항 위계가 단일 기준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연구 목적과 분석 맥락에 따라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항이 복잡한 네트워크 시스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positionality)가 어떻게 특정 지역과 도시 배후지(즉, 국가 하위(sub national) 규모)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재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면, 공항위계에 대한 더욱 엄밀하고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Grubesic et al 2009). Table 10은 학자들의 공항분류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였다.
| 저자, 연도 | 공항분류 |
|---|---|
| Bonnefoy et al., 2010 | 여객 교통량 비중에 따른 분류: 주요공항(20% 이하), 이차 공항(1%∼20%), 1% 미만은 분석대상 제외(primary airport, secondary airport) |
| Derudder et al., 2010 |
지리적 규모에 따른 분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공항 공항의 구체적 역할에 따른 분류: 허브공항, 지배적 공항 |
| Brueckner et al., 2014 | 대도시권의 주요 공항을 가장 많은 국내 OD(출발∼도착) 승객 수를 기준으로 식별; 대도시권 내 다른 공항들을 핵심(core)과 주변(fringe) 범주로 분류 (주요 공항과의 거리 기반) |
| Sun et al., 2017 | 여객 수 기준: 주요 공항(200만 명 이상), 이차 공항(10∼200만 명), 삼차 공항(10만 명 이하) |
Ⅳ. 결 론
우리나라 공항의 위계 체계는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통해 행정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법적·계량적 기준 없이 정성적 판단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연간 여객 1천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김포·김해·제주공항이 중·소규모 공항과 동일한 거점공항으로 분류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다. 위계가 단순 명칭이 아니라 재정지원·시설투자·정책 우선순위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체계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된 시사점은 객관성과 정책 연계성이다. EU는 Regulation과 Guidelines를 통해 여객·화물 처리량, 연결성 등 정량지표에 기반한 위계를 설정하고, Connecting Europe Facility 자금과 연계하여 차등적 지원을 시행한다. 미국 FAA는 NPIAS와 AIP를 통해 위계와 재정 지원을 일체화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일본은 2008년 공항법 개정을 통해 운영 주체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군 공용 공항을 제도화하였다. 이들 사례는 위계가 단순 행정 구분을 넘어 재정 배분과 규제 체계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준다.
민간 기구인 ACI Europe의 분류 체계는 정부 주도의 법제화와 달리 산업계 관점에서 공항 위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CI Europe은 연간 승객 처리량을 기준으로 Major, Mega, Large, Medium, Small airports로 구분하며, 화물 처리량, 네트워크 연결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보조 지표로 고려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비중이 높은 유럽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Regional 및 Small airport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처럼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국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큭히, 민간기구인 ACI Europe에서도 객관적인 정량 기준을 제시하여 위계 기준을 정립하였음은 충분히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항공정책 당국은 전국 공항을 자유로운 경쟁체재를 유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단순한 정책 결정으로 각 공항의 성장을 묶어놓으면 더 이상 세계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공항들은 경쟁적 집중도, 항공운송과 고속철도의 상호작용, 공항 공동체 구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분류된다(Chen 2022). 각 공항 스스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경쟁속에서 국내에서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의 유명한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위계의 기준을 정성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을 충분히 함으로서 향후 공항의 성장이 지역과 국가의 성장으로 순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Table 11은 미국 FAA 및 유럽연합의 위계 부여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제안이다. 우리나라의 위계 기준을 제안하되 기존 명칭과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량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서 국가의 항공정책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문 명칭은 중추공항, 관문공항, 지역거점공항, 연계공항, 기타공항이며, 영문으로 Super Hub Airport, Large Hub Airport, Regional Connecting Airport, Intermodal+General Airport, Miscellaneous Airport 등으로 명칭하면 표현이 부드럽다.
향후 우리나라 공항 위계 체계는 단순한 행정적 지정에서 벗어나, EU·미국·일본의 제도적 기준과 ACI Europe의 산업계 기준을 종합한 혼합형 위계 체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간 여객 수, 국제선 비중, 연결성 등 정량적 지표를 명확히 법제화하여 위계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위계에 따라 차등적 재정 지원과 규제 적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항공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특히 항공정책을 수립하는 당국은 전국 공항이 자유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책 결정에 의해 성장 잠재력이 제한된다면, 우리나라 공항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공항은 경쟁적 집중도, 항공운송과 고속철도의 상호작용, 공항 공동체 구조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류될 수 있으며(Chen, 2022), 각 공항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량적 위계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항의 성장이 곧 지역 및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항공선도국과 기관인 유럽연합(EU), 미국(FAA), 일본, 그리고 ACI Europe의 공항 위계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체계와 비교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자료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각국의 최신 정책 문서와 통계 자료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법령 개정 이후 실제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세부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정책 문헌과 제도적 기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항공사·승객·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관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공항 위계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안된 국내 위계 기준은 미국 FAA와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량화하여 항공선도국의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한국의 독자적 항공 수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지리적·경제적 조건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