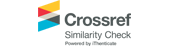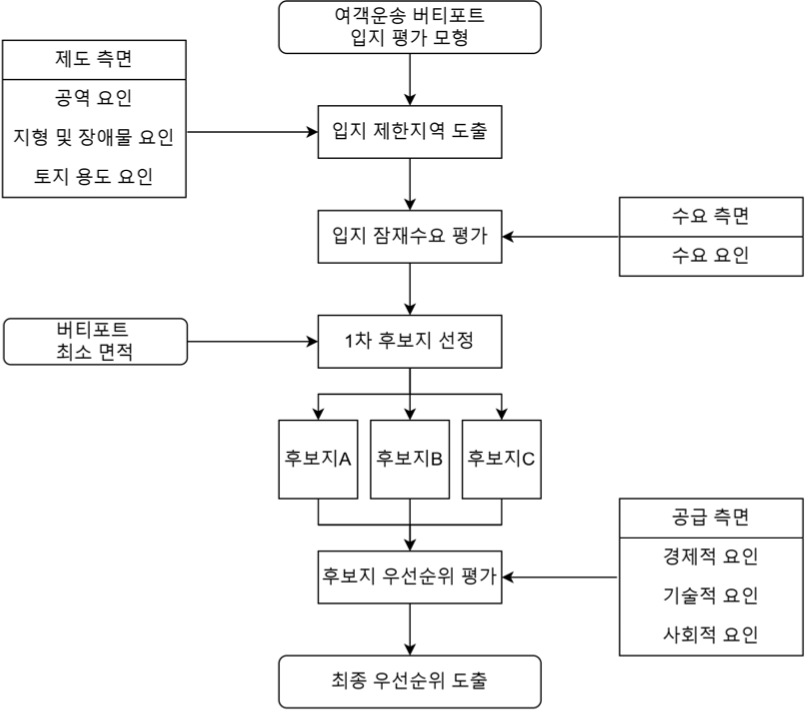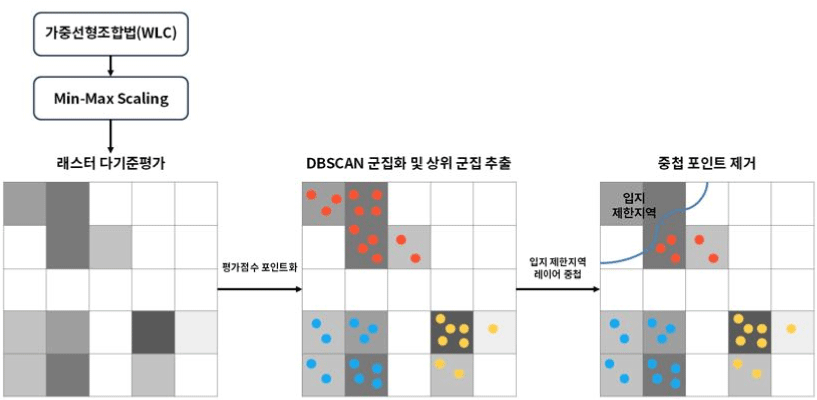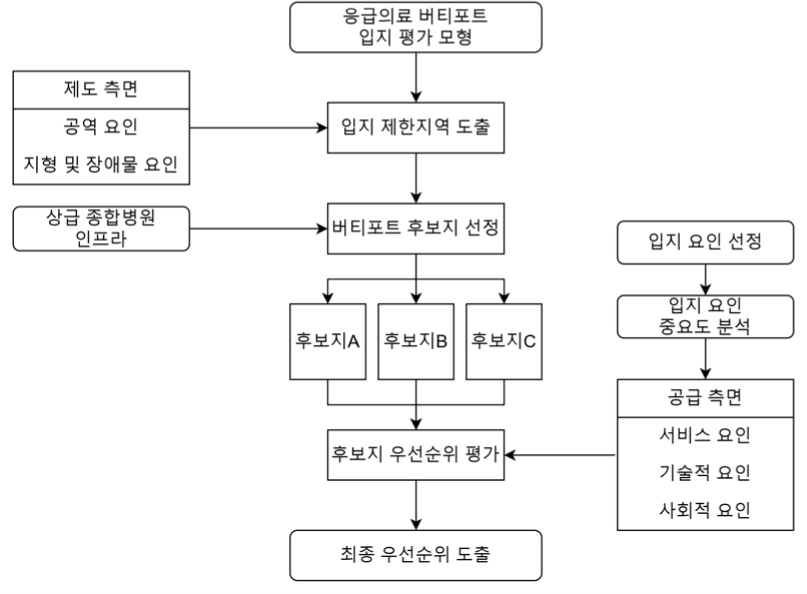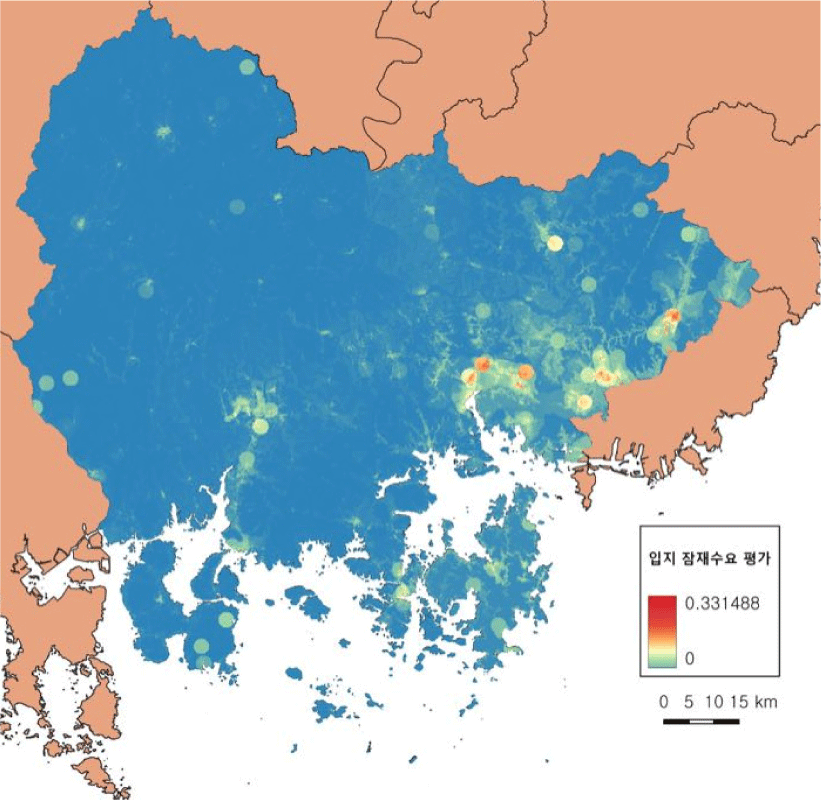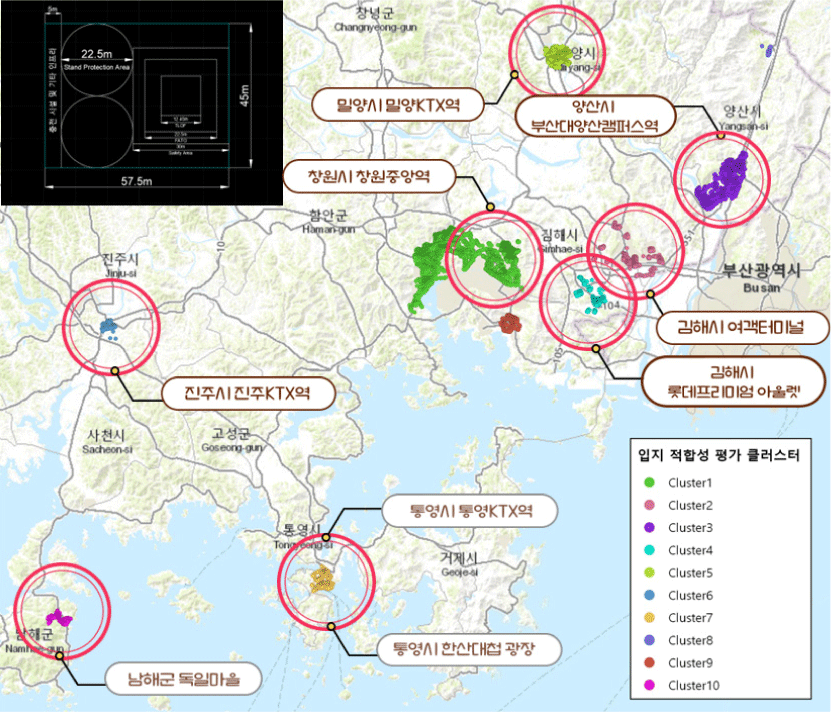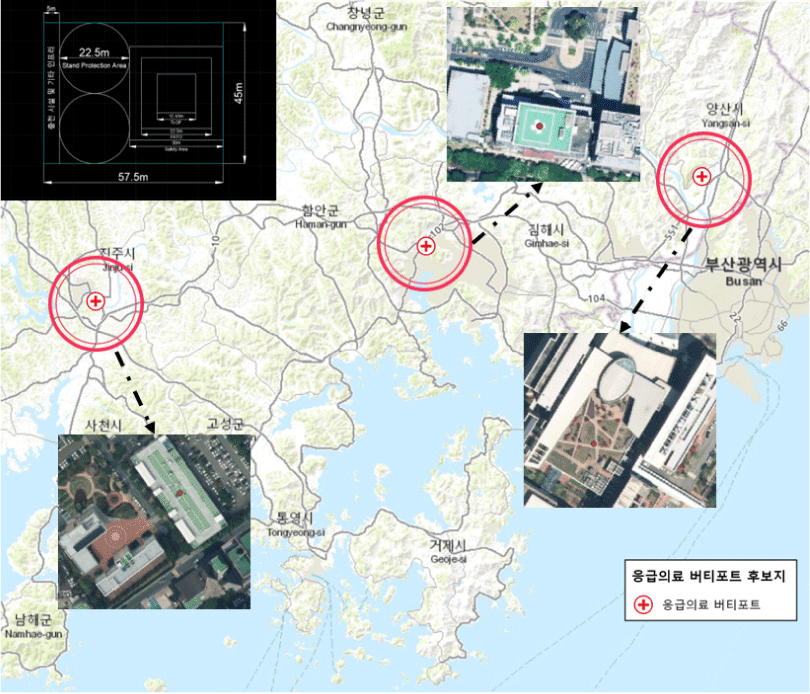Ⅰ. 서 론
대도시 인구 집중의 심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OECD, 2020). 인구 과밀화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등 사회문제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출현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에 세계의 관심과 기술력이 집중되고 있다(Choi et al., 2024). UAM은 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를 이용하여 도심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교통 체계로서 기체 개발, 기반 시설 구축과 관리,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UAM Team Korea, 2021). ‘도심 내’로 정의되었던 UAM은 그 운용개념을 확장하여 ‘도시 간’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체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AAM(advanced air mobility)으로 정의되고 있다(KAIA, 2021; FAA, 2023).
우리나라는 UAM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KAIA, 2021; Jang et al., 2024). UAM 상용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체 이외에 통신, 감시 및 교통관리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나, 수요와 목적을 반영한 버티포트(vertiport) 위치 선정과 구축은 필수적 요소이다(Straubinger et al., 2020; Choi et al., 2024). 버티포트는 기반 시설로써 건설에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한편, 구축이 완료된 이후 시설 확장과 이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 위치와 규모는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성과 서비스 제공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Kim et al., 2024).
버티포트 입지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하다. 사회경제적 요소(인구, 소득 등), 환경적 요소(소음, 공역, 토지 등) 및 교통적 요소(편익, 목적별 수요, 교통 네트워크 등)는 대표적인 예시일뿐 버티포트의 용도와 운용방식 등에 따라 고려할 요소는 달라진다(Hong & Park, 2024). 결정 요소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평가 기준과 프로세스로서,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는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개발되어야 한다(Kim & Park, 2022).
본 연구는 버티포트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프로세스의 필요에 주목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기법을 활용한 버티포트 입지 평가 모형을 구축하였다.
평가 모형은 제도 및 수요 측면의 분석을 통해 일차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급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산출하고 후보지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버티포트는 목적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와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여객 운송과 응급의료 목적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형태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한 모형을 토대로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실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입지 선정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대신, 평가 프로세스와 방법에 집중하였다. 입지 요인은 선행연구를 활용하되, GIS를 기반으로 서비스 목적별로 입지선정 방법과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버티포트는 수직이착륙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구조물로 공항 및 비행장과 유사한 개념이다(FAA, 2022). 버티포트의 기본 기능은 공항과 유사하고, 입지 선정에서도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소가 고려되나, 버티포트는 공항과 달리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 소규모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와 입지를 고려할 때 버티포트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버티포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입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크게 선정 요인과 방법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선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UAM 운용개념을 토대로 한다. Mendonca et al.(2022)은 NASA의 AAM ecosystem working groups(AEWGs)에서 도출된 450개 이상의 버티포트 구축 고려사항을 18개 카테고리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Vascik & Hansman(2017)은 버티포트 개발의 제약사항을 검토한 후, 기체 이착륙 성능, 토지 개발의 법적 제약, 소음 등 대중 수용성,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비용적 측면을 제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준을 고려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Fadhil(2018)은 영향요인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구분하고, 계층적 의사 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Kim and Park(2022)은 표면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입지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AHP 방법론을 통해 요인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Jung et al.(2021)의 연구는 버티포트 입지의 수요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요인을 제시하며, 기존 AHP 방법론을 보완하고 요인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분석(analytic network process, ANP)을 통해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버티포트 입지 선정 방법과 실증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입지 영향요인 등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Fadhil(2018)은 다양한 버티포트 수요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한 후, 다기준 평가기법을 활용한 GIS 분석을 통해 입지 적합도가 높은 지역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로스엔젤레스, 뮌헨을 대상으로 구축된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하였다. Lim & Hwang(2019)은 이용 수요와 이동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버티포트 입지를 평가하였다. 통근 인구 데이터와 K-Means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통해 위치를 선정하고, 세 개의 이동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버티포트 개수에 따른 이동시간의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버티포트 입지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Table 1). 다만, 평가에 관한 연구는 요인의 식별과 요인 간 중요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입지선정에 관한 방법과 실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객으로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버티포트 입지 선정 과정은 다양한 영향과 요인을 비교하고,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요인 간 중요성을 평가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다기준 의사결정은 복수의 기준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분석 방법이다(Lee, 2000).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개인의 가치가 다원화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성원의 집단이 다양화함에 따라 다기준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대안 선택은 일반적이다(Park et al., 2000). 다기준 의사결정법은 유한한 대안을 가정하는 다속성 의사결정법(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 MADM)과 무한개의 대안을 가정하는 다목적 의사결정법(multiple objective decision making, MODM)으로 구분된다(Taherdoost et al., 2023). 본 연구에 활용하는 다속성 의사결정법에는 평점 모형, 목표달성 평가법, AHP 등이 사용된다(Park et al., 2000).
공공시설물의 입지 선정에서 다기준 평가기법은 197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GIS가 공간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 도구로 그 기능이 확대되면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GIS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공간적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Lee, 2000).
Choi et al.(2004)은 수자원계획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Lee(2000)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할 때 GIS 기반의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Fadhil(2018)은 GIS 기반의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여 버티포트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버티포트 입지에 관한 다속성 의사결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속성 의사결정에 의한 기법에서 널리 활용되는 AHP를 적용하였으며, 가중선형조합법(weighted linear combination method, WLC)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반영한 후,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Choi et al., 2004).
선행연구의 종합적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에 집중하였다. 첫째, 입지선정 요인의 식별과 비교가 아니라, 평가 방법과 프로세스 개발에 집중하였다. 둘째, 입지선정 요인과 가중치는 선행연구를 활용하되, 일부분의 측면만을 고려하지 않고, 모형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을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셋째, 제도, 수요,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GIS 기반의 평가 프로세스와 함께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의 도출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넷째, 여객 운송에 집중되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서비스 목적에 따라 여객 운송과 응급의료로 구분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목적별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Ⅲ. 버티포트 입지 평가 모형
본 연구는 여객 운송과 응급의료를 서비스 목적으로 하는 버티포트 입지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서비스 목적에 따라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에 따른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객 운송과 응급의료에 관한 평가 방법과 프로세스를 달리 하였다.
여객 운송을 위한 평가는 ① 제한지역 도출 → ② 잠재 수요 평가 → ③ 일차 후보지 선정 → ④ 후보지 우선순위 평가 순서로 구성하였다.
응급의료를 위한 과정은 3단계이며, ① 제한지역 도출 → ② 일차 후보지 선정 → ③ 후보지 우선순위 평가로 순서로 구성하였다.
여객 운송용 버티포트 입지에는 교통량, 수요, 소득 등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Fadhil, 2018; Jung et al., 2021; Kim & Park, 2022). 다만, 최적의 입지선정에는 건축 제한사항, 세부 입지 타당성 등 시설의 공급 측면을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제한지역과 수요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별하여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급 측면에서 후보지 순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Fig. 1).
평가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제도 측면에서 입지 제한지역을 평가하고 도출하는 과정이다.
버티포트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제사항, 물리적 제한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Hong & Park, 2024). 본 연구는 두 개의 법령을 근거로 제한지역을 정하였다.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토지 용도별 건축 시설 제한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장애물과 공역 제한사항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한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특정 시설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이 제한된다. 다만, 용도지구의 제한 시설은 시․군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버티포트 설치가 제한되는 토지는 지자체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버티포트를 건축법상 운수 시설인 공항시설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는, 장애물의 분포를 고려한 제한지역으로, 초기 UAM은 시계비행방식(visual flight rules, VFR)으로 450m±150m의 고도에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UAM Team Korea, 2021). UAM 비행이 제한되는 입지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VFR 최저비행고도와 UAM 예상 비행고도를 고려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고도가 450m일 때, 도심 장애물과의 300m 이격을 최저비행고도로 적용하여 해발 150m 이상의 장애물이 분포하는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결정하였다.
세 번째는, UAM의 공역 사용을 고려한 입지의 제한으로, 항공안전법은 통제공역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을 제한하며, 별도의 승인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 UAM 비행고도와 중첩되는 통제공역을 선별하였다.
입지 평가를 위한 일차적인 단계로, 입지 제한지역의 결정은 각 요인에 의해 도출된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초로 레이어(layer)를 생성한 후, 이를 통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두 번째 평가과정은 수요의 측면에서 입지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다. 본 연구는 GIS 분석을 기반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을 수행하여 수요 관점의 입지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Fadhil(2018)은 여객 수요관점에서 입지에 대한 요인을 제시하고, AHP 분석을 통해 요인별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영향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하되, 요인에 대응하는 국내 공간정보를 수집하였다(Table 2). 다만, 국내에 공간정보가 부재한 경우에는 해당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로 대체하였다. Table 2에서는 평균 교통 비용, 주요 교통 체계 및 관심 지점(point-of-interest, POI)에 대한 요인을 각각 지하철역/정류장별 이용량, 철도(KTX 등) 역사별 이용량, 관광지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로 대체하였다.
GIS 기반의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을 위한 공간 범위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분석 단위는 표준 격자 체계에 따라 100m 단위의 격자(grid)를 래스터 형식으로 구성한 후, 서로 다른 공간 범위를 갖는 데이터를 표준 격자에 할당하고, 요인별 데이터를 중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류장별 이용량, 철도 역사별 이용량, 관광지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등과 같이 점(point)의 형식으로 구성된 요인은 도보 접근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범위를 설정하였다(Kim et al., 2001; Yang & Diez-Roux, 2012). 통근 목적 통행 발생량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서 정의한 O/D 구역의 데이터를 표준 격자로 할당하여 처리하였다.
단위 격자별 점수 산정을 위한 수집된 자료의 표준화와 가중치의 반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먼저, 공간 데이터 간 수치의 단위가 상이함에 따라 Min-Max Scaling을 적용하여 0∼1 사이의 값으로 그 범위를 표준화한다(Eq. 1). 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한 단위 격자의 총점수는 가중선형조합법으로 산출한다(Eq. 2). 여기에서는 요인의 표준화된 공간 데이터를 가중치와 곱하고, 모든 요인의 값을 합산함으로써 단위 격자의 총점수를 산출한다.
여기서,
A : 공간 단위별 입지 평가점수(0≤A≤1)
w : 가중치
X : 입지별 영향요인의 수치
X': 영향요인의 표준화된 값
잠재 수요가 높은 지역은 단위 격자의 총점수를 기초로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다. 클러스터링을 위해 단위 격자별 0∼1의 범위로 할당된 점수에 적절한 상수를 곱하여 정수로 전환하고, 정수값에 따라 점을 생성함으로써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클러스터링은 이상치 탐지에 유리한 DBSCAN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점의 개수가 많은 상위 10개 클러스터(cluster)를 추출하여 평가 후보지로 선정하였다(Fig. 2).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제한지역과 중첩을 고려함으로써 적합성이 높은 지역을 추출하게 된다.
세 번째 과정은 후보지 선정이며, 이전 과정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대상으로 버티포트 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공급 측면에서 입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상으로 포함된다.
본 연구는 EASA(2022)에서 개발한 이착륙구역 및 주기장의 최소 규격과 FAA(2022)의 지침에 따라 날개폭(wingspan)을 기준으로 15m의 기체 크기를 적용함으로써 버티포트 크기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버티포트는 FATO(final approach and takeoff area) 1개와 주기장 2개로 가정하고, 충전 시설과 기타 인프라를 위한 공간으로 5m를 추가할 때, 최종 규격은 57.5 m×45 m로 계산된다. 그 결과, 총면적은 2,587.5 m2로 산출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다시 연계 시설에 따라 복합환승 센터형, 건물 상부형, 개활지 모듈러형 및 주차장 상부형 등으로 구분하였다(UBER Elevate, 2016, Hyundai E&C, 2023). 버티포트 유형은 시공 용이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다음 단계에서 평가된다.
평가의 네 번째 단계는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급 측면의 요인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버티포트 입지 평가를 위해서는 입지의 공시지가, 토지 이용 가능성, 비행경로 설정 가능성 등 공급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Mendonca et al., 2022). 다만,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초기 평가단계에서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 요인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후보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한 후,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Jung et al.(2021)은 버티포트 입지선정 요인을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평가 요인과 중요도를 활용하되, 일부 요인을 변경하여 토지 비용은 토지 확보 비용과 토지 이용 가능성으로 구분하고 법, 제도 요인은 평가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선행연구는 입지선정 요인과 가중치를 제시하였으나, 평가를 위한 실질적 방법과 기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평가를 위해 구체적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상, 중, 하의 3단계 척도에 각각 5점, 3점, 1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준을 정하였다(Table 3).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의 평가로서, 입지선정 요인은 토지 확보 비용, 토지 이용 가능성, 접근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기준에 대해 토지 확보 비용은 해당 입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토지 이용 가능성은 향후 매입에 따른 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입지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접근성은 주변 대중교통 인프라 현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거리의 기준은 1.5 km와 400 m로 구분하였다(Kim et al., 2001; Yang & Diez-Roux, 2012).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의 평가로서 여기에서는 비행경로 설정 용이성, 전력 공급의 용이성, 버티포트 유형에 따른 시공 용이성을 평가한다. 비행경로는 과거 5년간의 풍향 자료를 기초로 예상한 입출항 방향을 장애물과 주변 공역 배치를 고려한 방향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장애물 평가 기준은 EASA(2022)에서 제시한 버티포트 장애물제한표면의 적용을 제안한다. 전력 공급은 버티포트의 연간 예상 전력 사용량과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가능 용량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에서 제시된 연간 충전량인 52MW를 기준으로 하였다(KAIA, 2021).
사회적 측면은 법과 제도 요인을 제외한 청각 및 시각적 소음 요인만을 고려하되, 풍향을 기준으로 예상한 비행경로 내 주거지역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청각, 시각적 소음 요인을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후보지별로 입지선정 요인에 따라 부여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의 척도로 변환하고 평가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
응급의료 목적의 버티포트는 중증 환자를 필요한 응급의료 시설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과 근접하면서 입지 제한지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입지를 응급의료를 위한 전략적 후보지로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앞의 여객 운송 목적의 평가과정과 달리, 입지요인이 달라져 추가로 AHP 분석을 진행하여 요인별 가중치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평가하여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체계적 절차를 제시한다(Fig. 3).
본 연구에서는 공역과 장애물의 배치가 응급의료 목적의 버티포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긴급 수송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입지선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는 여객 운송을 위한 버티포트와 다르다고 간주하였다. 현행 응급의료 헬기장이 병원 등 의료 기관의 보조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버티포트를 운수 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토지 이용에 따른 별도의 제약도 적용하지 않았다.
응급의료 버티포트에 대한 제도 측면의 평가에서는 공역과 장애물 제한만을 적용하여 입지 제한지역을 도출하였다.
응급의료용 버티포트의 입지 선정 평가에는 운송용 버티포트와 달리 여객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의료 UAM의 운용개념과 버티포트 설치에 필요한 적정 면적의 부지에 대한 고려는 평가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현행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은 의료 시설 인근 헬기장에서 의료진이 탑승한 후,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헬기 배치병원을 지정하고, 병원 내 또는 인근에 이착륙장을 설치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UAM을 활용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운용방식은 현행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응급의료용 버티포트는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한 병원 인근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헬기 배치병원으로 지정된 8개 병원 중 5개 병원은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 인근은 응급의료 버티포트의 입지로 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헬기 배치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의 시설이나 인근 지역 중, 앞에서 기준으로 한 버티포트 크기를 충족하는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여객 운송용 평가에서 활용한 Jung et al.(2021)의 연구는 입지선정 요인별 중요도를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입지선정 요인은 버티포트 시설의 운영 및 건축에 관한 요소로 다양한 목적의 버티포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경제적 측면은 상업적 운용에 따른 이점을 반영한 요소로써, 공공 목적의 버티포트 입지요인으로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용성을 나타내는 서비스 측면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서비스 측면의 평가 방법과 기준은 일차 후보지를 중심으로 UAM 운용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의료 취약 인구의 규모를 고려하였다. 응급의료 서비스 범위는 닥터헬기의 운용 지침(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에 따라 버티포트를 반경으로 70km로 하였다. 다만, 도서 지역의 경우, 내륙에 비해 환자 이송의 제약이 크므로 같은 규모라도 서비스의 효용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입지선정 요인을 도서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객 운송 버티포트에 적용한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용하되, 응급의료 버티포트의 특성에 따라 연계 시설을 고려한 유형에서 복합환승 센터형을 배제하면서 기존 헬리포트 개조를 포함하였다. 유형의 변동에 따라 시공 용이성의 평가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응급의료용과 여객 운송용 버티포트 후보지에 대한 공급 측면의 평가는 서로 유사하다. 다만, 버트포트 목적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그 평가 요인과 방법을 변경하면서 요인별 중요도의 조정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중요도 조정을 위해 AHP 분석을 진행하였다. AHP 기법은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으로 비행장 입지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Park, 2023). 입지 요인 분석을 위한 계층화 구조에서 1계층은 서비스 측면, 기술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2계층은 Table 5에 제시된 항목들을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 1계층 | 중요도 (%) | 2계층 | 중요도 (%) |
|---|---|---|---|
| 서비스 측면 | 29.5 | 도서 응급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범위 | 18.8 |
| 내륙 응급 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범위 | 10.7 | ||
| 기술적 측면 | 39.1 | 비행경로 구성 용이성 | 25.5 |
| 전력원 공급, 시공 용이성 | 13.6 | ||
| 사회적 측면 | 31.3 | 청각, 시각적 소음 | 16.6 |
| 법, 제도 | 14.7 |
설문은 항공 운송, 의료,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총 36개의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0.2를 초과하는 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한 후, 22개의 설문을 분석하였다(Table 6). 일관성 비율은 일관성 지수와 임의 지수의 비율로, 쌍대 비교 행렬의 고윳값(λ)을 통해 산정된다(Eq. 3, 4). AHP 분석에서 도출된 가중치는 입지선정 요인,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과 함께 Table 4에 반영되었다.
| 구분 | 응답자 | |
|---|---|---|
| 분야 | 항공 | 14 (63.6%) |
| 의료 | 6 (27.3%) | |
| 건축 | 2 (9.1%) | |
| 경험 | 1년 미만 | 4 (18.2%) |
| 1년 이상, 3년 미만 | 8 (36.4%) | |
| 3년 이상, 5년 미만 | 4 (18.2%)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4 (18.2%) | |
| 10년 이상 | 2 (9.1%) | |
여기서,
CI :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λmax : 고윳값(λ)의 최댓값
n : 평가 항목의 수
RI: 임의 지수(random index)
Ⅳ. 평가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본 연구는 입지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여객 운송용 버티포트와 응급의료용 버티포트의 입지 후보지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경상남도는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은 인구수를 가지며, 도서 지역이 넓게 분포함에 따라 내륙과 도서 지역에서의 여객 운송에 UAM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닥터헬기가 운영되지 않고 의료 취약 인구 비중이 높아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한 UAM 서비스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 모형 4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9개 지점의 버티포트 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지를 평가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역, 토지 용도, 장애물 분포를 고려하여 경상남도 지역의 버티포트 입지 제한지역을 도출하였다. 국내에 구축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입지만을 추출한 후, 버티포트 입지 제한지역에 대한 단일 레이어를 생성하였다.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UAM의 비행을 제한하는 통제공역은 두 곳으로 양산시에 설정된 비행제한구역 R21과 비행금지구역 P61B이다. 해당 공역에 대한 공간정보는 항공정보 데이터를 통해 추출하였다. 다음은 토지 용도에 따른 제한지역으로 경상남도 9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운수 시설이 제한되는 토지를 분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제한지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00m 단위의 건축물 높이 데이터와 90m 단위 수치표고모형의 지형 데이터를 결합한 후, 해발고도가 150m 이상인 지역을 도출하였다.
세 가지 제한사항을 모두 결합하여 표시한 입지 제한지역 레이어는 Fig. 4와 같다(용도지역 내 운수 시설을 초록색으로 표시했으나, 지역이 중첩되면서 검은색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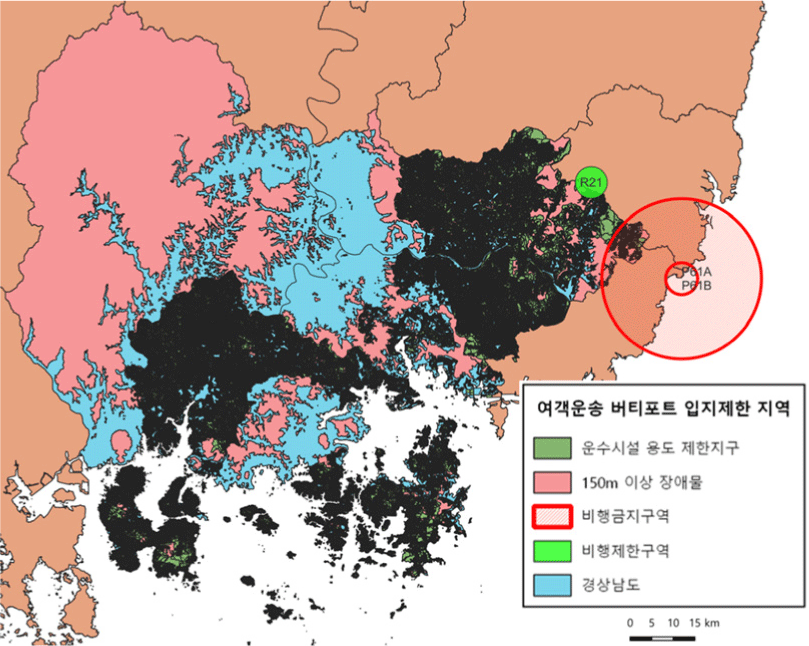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상남도 지역의 잠재 수요를 분석하였다. 입지 영향요인별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향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의 결과는 Fig. 5와 같다. 단위 격자의 총점수는 도심지인 양산, 진주, 김해, 통영 그리고 창원을 중심으로 높은 점수의 격자가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잠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단위 격자의 총점수를 점으로 환산하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다. 클러스터링은 점 개수를 기초로 진행하되, 상위 10개 클러스터를 식별한 후, 입지 제한지역 레이어와 겹치는 격자에서 점을 제거하여 여객 수요가 높으면서도 입지 제한은 없는 지역을 도출하였다(Fig. 6).
잠재 수요에 대한 평가 결과, 김해, 진주, 창원, 양산, 밀양, 통영시 그리고 남해군 등 7개 시․군 주변으로 클러스터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지역 내에서 버티포트 면적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9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Fig. 6). 김해와 통영시에는 후보지가 2개 지점이 선정되었다.
연계 시설에 따른 유형은 수요의 집중과 편의성, 접근성 관점에서 유동 인구가 높은 대형 쇼핑센터, 주요 관광지,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 가능한 KTX역, 버스 터미널 등으로 하였다(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지하철을 고려하지 않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일차 후보지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입지선정 요인별 상(5점), 중(3점), 하(1점)로 평가하고, 선정 요인별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9개 후보지의 입지 적합성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역 광장은 비행경로 구성 용이성, 시공 용이성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인근 장애물로 인해 서쪽과 동쪽으로 비행경로 설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복합 환승센터형으로 개활지 모듈러형에 비해 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 KTX역, 김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주차장 그리고 KTX 진주역 주차장은 순서대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여객 운송을 위해서는 최소 2개의 버티포트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간 연결성을 고려할 때, 하위 후보지는 잠정적인 버티포트 입지로 검토될 수 있다. 김해 여객터미널의 경우, 잠재 수요와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하나, 인근의 밀집된 건물, 인구에 따른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후보지 중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응급의료 목적의 버티포트 입지 평가 모형 프로세스는 3단계로서 경상남도 지역에서 3개 지점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첫 번째 단계의 입지 제한지역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입지 제한지역을 제외한 경상남도 내 상급종합병원은 경상국립대학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및 양산 부산대병원 세 곳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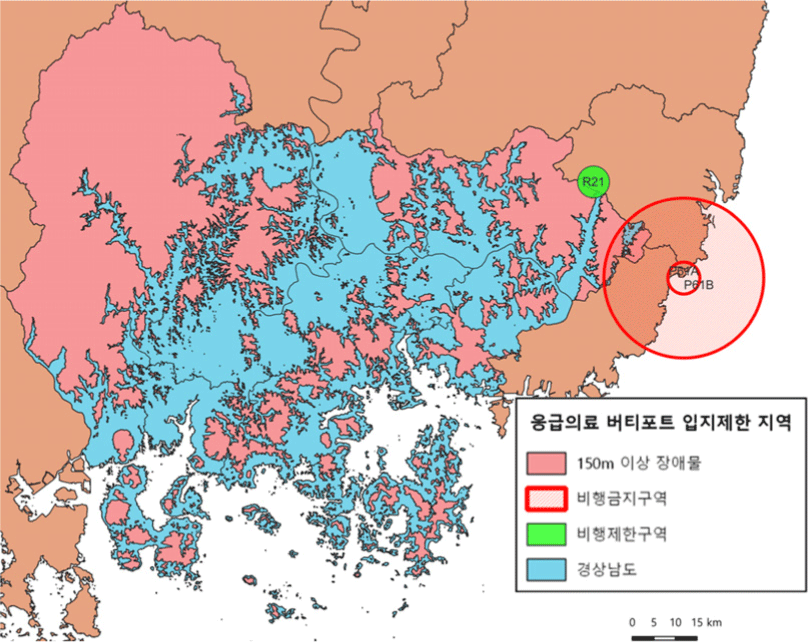
응급의료용 버티포트의 입지 평가에는 잠재 수요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두 번째 단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인근 부지를 탐색하여 버티포트 면적의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일차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경상 국립대학병원 주차빌딩, 삼성창원병원 헬리포트 및 양산 부산대병원 하늘정원이 일차 후보지로 선정되었다(Fig. 8).
세 번째 단계는 일차 후보지에 대한 공급 측면의 우선순위 평가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된 응급의료용 버티포트 후보지별 우선순위 결과는 Table 8과 같다.
| 지역 | 후보지 | 도서 서비스 범위 | 내륙 서비스 범위 | 비행경로 구성 용이성 | 전력원 공급 | 시공 용이성 | 청각, 시각적 소음 | 평가 점수 (10점) |
|---|---|---|---|---|---|---|---|---|
| 진주시 | 경상국립대학병원 주차빌딩 | 상 | 상 | 중 | 상 | 하 | 중 | 7.19 |
| 양산시 | 양산부산대병원 하늘정원 | 중 | 하 | 상 | 상 | 하 | 중 | 6.60 |
| 창원시 | 삼성창원병원 헬리포트 | 중 | 중 | 중 | 하 | 상 | 하 | 5.33 |
진주시의 경상국립대학병원이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는 UAM 응급의료 서비스 범위 70km 내 북쪽으로 응급의료취약 인구 비율이 높은 합천, 산청, 의령군이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한산도, 욕지도 등 도서 지역이 위치함으로써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경로의 설정에서도 인근 장애물로 인해 5년간의 풍향으로 정렬되지 않으나, 양방향 입출항 경로의 설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평가된 삼성창원병원 헬리포트는 현재 사용 중인 병원 응급의료용 헬리포트 시설을 개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공성이 우수하다. 다만, 남동쪽 부근에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비행경로 설정에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남서쪽에는 주거지역이 다수 밀집되어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UAM 운용의 핵심 기반 시설인 버티포트의 입지 선정에 관한 객관적, 체계적 평가 절차와 방법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서비스 목적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최근 UAM의 활용 계획을 반영하여 형태를 여객 운송용과 응급의료 용 버티포트로 구분하고, 각각에 적합한 GIS 기반의 입지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과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여객 운송용 버티포트의 입지 평가는 4단계 프로세스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장애물, 공역 등 입지 제한지역을 도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 잠재 수요가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버티포트 면적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9개의 일차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급 측면의 분석을 통해 최종의 입지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응급의료 목적의 버티포트 입지 평가는 3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입지 제한지역의 평가 단계로, 여객 운송 버티포트 평가과정과 달리 토지 용도에 따른 제한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인 일차 후보지 선정에서는 버티포트의 부지 면적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내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3개 지점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본 연구는 AHP 기법을 통해 서비스, 기술적, 사회적 측면의 입지선정 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중요도에 따라 3개 후보지를 평가하고, 최종의 입지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입지선정 요인을 통합하여 버티포트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우선순위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만, 후보지 선정 및 우선순위 평가과정에서 버티포트 간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이다. 여객 운송용 버티포트는 최소 두 지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수적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한 평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입지선정의 초기 의사결정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