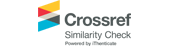Ⅰ. 서 론
국제법을 이루는 주요 법원 중 조약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약은 국제법 주제들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라고 정의된다(Jeong, I. S., 2016) 이는 항공운송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국제계약이 주가 되는 항공운송의 특성상 출발지와 도착지, 항공사의 국적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탑승객의 국적 또한 다양한 까닭에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 즉, 조약의 해석은 곧 국내법의 그것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은 바르샤바협약은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항공운송법(Carriage by Air Act) 제1조 제1항은 항공운송에 적용될 국제협약의 각 규정들은 항공운송에 사용된 항공기의 국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국 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이를 서명 및 비준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환승편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한 통일성이 중요한 까닭이 이해된다.
그러나 일반 국제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항공운송 국제조약을 해석하는 방향을 같이 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인간의 존엄을 그 동안 중요시해 왔으며, 비엔나 협약이나 세계인권선언 등으로 추상적인 인간의 권리와 그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던 국제협약의 내용과는 달리 항공운송은 그 상업적 관계와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더 중점을 둔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고 그 행동 및 손해배상 등의 요구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국제관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개인이 소비자인 여객으로 계약을 맺은 후 지연배상, 항공사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항공사 등의 운송인이 그 가해자로 등장한다. 이에 몬트리올 협약, Regulation 261 등의 국제조약 등이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며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국제법의 논의들을 그대로 항공운송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체적인 항공운송 손해배상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법의 해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국제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큰 두 가지 주류가 되어왔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관점뿐 아니라 Ronald Dworkin이 주가 되는 해석주의를 도입해 봄으로써 어떤 해석이 제일 항공운송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평석의 주제로 삼은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은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EC 261/2004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이다(Gahan v Emirates and Buckley and ors v Emirates, 2017). EC 261/2004 규정에 따르면, EU 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동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나아가 EC 2612004는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중심을 둔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에도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Ⅱ. 항공운송 국제조약 주요 내용
1999년 5월 28일 채택된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하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 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 제19조는 항공사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운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 책임을 정한다. 다만, 항공사가 자신과 그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과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한편, 제29조는 승객, 수하물,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조건과 책임한도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협약에서 정한 범위와 한도를 벗어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예시적 손해배상 등 보상적 성격이 아닌 추가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공운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만이 허용되고, 그 외의 추가적•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004년 2월 11일 제정된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이하 ‘EU 항공여객보상규정’ 또는 ‘EC 261/2004’)은 항공편의 탑승 거부, 결항, 장시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제공해야 할 보상 및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공여객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유럽연합(EU)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과, EU 역외에서 출발하여 EU 역내에 도착하는 EU 항공사 운항편에 적용된다. 해당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 또는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부가 발생한 경우, 승객은 EC 261/2004 제7조에 따른 지연 시간 및 운항 거리 등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250유로에서 600유로까지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는 제9조에 따라 승객에게 식사, 숙박, 교통 등 필요한 지원(right to care)을 제공해야 하며, 지연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 제6조 제1항(c)(iii)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환불 및 귀환 항공편 등의 추가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EC 261/2004 제5조 제3항에서는 몬트리올 협약 제29조와 같이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편의 탑승 거부, 결항, 장시간 지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존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Ⅲ. 항공운송 국제조약의 본질과 그 해석에 대한 논의
국제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법실증주의는 항상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실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보이지 않는다(Kim, S. W., 2017). 법실증주의의 개념상 불명확성이 법실증주의의 대표적 성격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법실증주의의 옹호자나 반대자 모두 법실증주의의 내용을 상이하게 이해하거나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L. Vinx, 2007; F. Lachenmann, 2012). 이에 본문에서는 그 대표 주자로 일컬어지는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순수이론을 바탕으로 법실증주의를 한정시키기로 한다.
Kelsen의 법의 순수이론에 따르면 모든 법규범은 기타 가치들과 분리되어 그 체계 안에서만 유지 ‧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규범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위규범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 또한 예외가 아니다. 헌법의 유효성을 부여하는 상위규범으로서 Kelsen은 근본규범을 제시하는데, 근본규범은 모든 법규범의 유효성을 부여하는 시원적(始原的) 법규범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국제법의 규칙도 실제로 행해지는 사실적 행위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정의, 도덕, 정치, 인간성 등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성적 요소들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L Oppenheim, 1908).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실질 사안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국제법은 본질적으로 해석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일련의 사실들을 규칙으로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쟁점에 대해 국제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Park, J. W., 2018). 항공운송의 경우, 다양한 양상의 사안들이 존재하고 어떠한 가치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몬트리올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opened for Signature at Montreal on 28 May 1999. (ICAO Doc No 4698).)의 계약을 flights와 journey로 나누어 해석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결 (C-173/07) Emirates Airlines – Direktion fur Deutschland v. Schenkel(2008) ECR I-05237이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사안에서는 독일의 뒤셀도르프를 출발하여 두바이를 경유,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return flight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가 문제되었다. CJEU는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상 그와 같은 전체 항공운송이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체결되었다면 개별구간 운송, 즉 outward flight(두바이를 경유하는 마닐라에서 뒤셀도르프까지의 비행)와 return flight(두바이를 경유하는 뒤셀도르프에서 마닐라까지의 비행)는 각각 별도의 여정(journeys)이라 할 수 있고 여행의 단위인 비행(flights)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두 단어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문의 사안에서 중심이 되는 EC 261/2004 제6조 지연운항의 규정에는 여정을 뜻하는 journeys가 아니라, 비행을 뜻하는 flights가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서 보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원은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flights를 journey의 수단이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단어의 구별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것이지, 법실증주의의 주장과 같이 가치중립적인 사실들을 규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법실증주의는 국제법의 법원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도 항공운송계약과는 맞지 않다. 이러한 사례에서 journey와 flight의 해석을 도출해내는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법의 법원에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들의 동의에서 추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의 주체는 과거와 달리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 다국적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국가의 동의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중심적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자연법론은 입법자인 국가에 의하여 정립되어짐으로써 그 존재 및 효력이 인정되는 실정법 이전에 그 자체로 타당하며 영원․불변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은 자연법을 그 법적 기초로 하여 정립되어야만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만일 자연법과 어긋나는 내용을 갖게 되는 경우, 그 법적 기초를 상실함으로써 효력을 잃게 된다(Jianming Shen, 1999).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권보호에 대한 확신은 전통적으로 자연법론이 가장 중시해 온 이념적 가치이자 방법론적 기초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및 국제법학계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 및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제고함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연법학자들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법학에서 자연법론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H. Lauterpacht, 1950). 일반적으로 또는 유엔헌장과 인권장전을 통한 국제적 인권보장을 논의할 때 그것이 국제법주체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갖는 자연적이고 불가양도적인 권리의 확보에 대한 인간통치와 관련된 국제법과 자연법의 상호작용을 배경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Oh, B. S., 2011).
현대에 국제인권법은 물론 국제형사법 등도 인도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여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 중심적인 형태를 취하던 국제협약의 모습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제법의 주체들이 나타나면서 인간 중심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im, B. C., 2012). 그러나 항공 운송계약의 특징을 보았을 때 이는 단순히 “인권보장” 또는 이성에 대한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공운송 계약은 다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 존재한다. 물론 자연법론자들은 EC 261/2004이나 몬트리올 협약 및 바르샤바 체제를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판례가 많이 나오는 양상을 볼 때 항공운송 계약에서도 실정법에 이전에 존재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으며 그렇기에 자연법론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단면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치들은 영원․불변하며 실정법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객의 보호 이외에도 항공 산업의 원활한 경영 및 발전 등의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각 사안마다 특정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손해를 본 개인의 지연배상 범위 제한이나 항공 사고의 조사국을 규정하는 법률 해석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판례들을 보면 그런 점이 더욱 부각된다.
Dworkin은 유고 논문인 “A New Philosophy for International Law”에서 그의 해석주의 법철학을 국제법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Ronald Dworkin, 2013). 국제법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도덕이며 해석적 개념으로서의 법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Park, J. W, 2018).
국제법이 진정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통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Dworkin은 국제법의 정통성 이론을 국가들의 “연대적 의무” 속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사회에서는 어떤 규칙들을 공동체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집단적, 정치적 결정의 필요 없이 그들의 권리로서 강제적인 공적 기관에 의해 집행되게끔 요구할 수 있는가를 질문함으로서 존재하는 법을 확인할 수 있다(Ronald Dworkin, 2013). 이 과정에서 재판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사들은 법관행을 확인하고, 해석함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답을 주고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관할할 수 있는 재판소가 없다. 이에 Dworkin은 규범적 가정으로서 전 세계를 관할하는 세계재판소를 상정한다. 이 가상의 정통성 있는 재판소가 보호하는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제법의 정통성을 위한 원칙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Ronald Dworkin, 2013). 이하 후술하는 사례에서는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EU 조약국의 국내법원(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과 CJEU(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이는 항공운송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 원칙들은 국가들이 자국의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강제적인 국내법 체계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체계의 일부를 이룬다. 몬트리올 협약, EU 261/2004 등 각국은 항공 운송협약을 통해서 자국의 항공사를 규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피해를 보상한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상호 도덕적 의무관계로 인식하는 해석주의 법철학에서 이런 도덕적 관계를 국제법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Park, J. W., 2018). 특히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항공사 또한 국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현대 국제법의 추세에도 합리적이다. 모든 집단은 개인들이 모여 국제법의 주체로 기능하고 각 집단은 국제질서의 구축에 협력하며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해석적 태도는 역사, 사회적으로 변화한다. 존재하는 법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이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법관행이 지지하는 가치에 대한 상세한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법관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특별한 규칙을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나간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관행의 모습에 따라 그 해석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항공 산업은 무인항공기 등이 도입되고, 항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 관행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사안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항공사의 유연한 대처와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보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조약의 당사자들의 의사란 그들이 조약의 체결에 이르는데 영감을 준 일련의 생각들을 유기적으로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약 당사자들의 객관화된 공통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 체결 이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로 당해 조약의 의무에 구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사안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제법 해석론의 방법론이 되어왔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가 국제법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해석주의 법철학은 추상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연역적 법 개념에서 벗어나 꼼꼼하게 법관행의 가치의 정당성을 따지기를 촉구한다. 해석주의는 법관행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계속적인 최상의 논거 제시와 반박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동체에서의 일정한 가치의 객관성을 역사적으로 확보한다. 가치판단에 의한 국제법의 해석은 결코 자의적인 주관적 해석이 아닌 일정한 객관성을 담보한다. 각 해석자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어떤 해석이 그 관행을 최선의 것으로 보이게 해주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회적 관행뿐 아니라 앞서 말했던 해석의 한 유형인 대화와 과학적 해석도 같은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Ronald Dworkin, 1986). 다른 맥락에서의 해석이 다른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다른 분야의 작업은 그 가치나 성공의 면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의 해석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정치이념으로서의 통합성은 우리의 헌법구조와 헌법적 실천의 제 성격에 부합하며, 통합성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헌법구조와 헌법적 실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onald Dworkin, 1986). 원리의 공동체는 통합성을 받아들여 정의와 공정성에 관하여 견해 차이를 갖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공동체의 요건을 더 잘 충족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해석을 통해 일관성과는 다른 현재의 “통합성”에 따른 목적이 있어야 됨을 의미한다. 결국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해석은 사회적 실천의 존재이유를 탐구하고, 그에 맞게 제도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기준은 역사가 제공한다. 정답은, 그렇지 않은 다른 해석들보다 더 제도를 잘 설명하게 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은 도태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이 사회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사회적 실천을 더 잘 정당화시키는 정답에 밀려 사라지게 된다(Ronald Dworkin, 1986).
항공 운송계약은 날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적 쟁점이 되는 어려운 사안, 즉 hard case에 대해 국제법이 어떤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 이하 제시하는 판례에서 연결편에 대한 지연보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최선의 해석이 무엇일지 고민해볼 수 있다. 이 또한 조약 당사자들의 진의를 국제법의 근본 원칙들에 비추어 이해하는 과정이며 해당 법관행에 관계되는 참여자들의 계속적인 가치판단의 과정을 통해 조약문의 진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관련 국제법관행의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논거 제시와 반박을 통한 법관행의 정당화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변화와 연속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Park, J. W., 2018).
Ⅳ. 사안의 개요
하나 이상의 항공편이 이용되는 환승운송 중에서 단일 항공사에 의해 모든 운송계약이 이행되는 직접 연결편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항편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념이 지연도착을 판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이창재, 2017).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 Gahan v. Emirates and Buckley and ors v Emirates(2017) EWCA Civ 153에서는 EC 261/2004의 지연보상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다(Lee, C. J., 2015).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본 사안은 영국 리버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된 별개의 2개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다. 두 사안은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같은 쟁점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Miss Thea Gahan)는 아랍 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에서 설립된 피고 Emirates 항공사와 영국 맨체스터를 출발하여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서 태국의 방콕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하나의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맨체스터와 두바이까지의 거리는 5,652.02km였는데, 원고가 탑승한 항공편은 두바이에 3시간 56분 연착하였다. 첫 번째 비행구간의 연착에 따라 원고는 두 번째 비행구간인 두바이에서 방콕까지의 연결편에 탑승하지 못하였고 결국 최종 목적지에는 13시간 37분이나 지연되어 도착하였다. 원고는 EC 261/2004 제7조에 따라 지연손해의 보상을 피고 항공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결편으로 운송된 당해 전체 운송계약에서 첫 번째 운송인 영국 맨체스터에서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까지만 EC 261/2004의 적용대상이라고 판시하며 두 번째 운송의 보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비행에 관한 연착에 따른 보상으로 300유로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 사안과 마찬가지로 연결편을 이용한 운송이 문제된 사안이다. 3명의 가족으로 구성된 원고는 영국의 맨체스터를 출발하여 두바이를 경유, 최종 목적지인 시드니까지의 여행을 위해 피고 항공사와 “하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맨체스터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첫 번째 운송구간에서 항공편이 지연되어 2시간 4분의 연착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두 번째 항공편 출발시각 46분 전에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연결편 탑승은 불가능했고, 다음번 항공편으로 예약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최종 목적지인 시드니에는 예정시각보다 16시간 39분이나 지연되어 도착하였다. EC 261/2004에 따른 지연손해의 보상을 청구한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운송구간만이 EC 261/2004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첫 번째 운송구간에서의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어떠한 보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며 각각에 대해 505.31 유로의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EC 261/2004의 문언상 ‘여정(journeys)’이라는 표현 대신에 ‘비행(fligh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규정상 분명히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두 번째 항공운송의 지연은 첫 번째 항공운송의 연착으로 인한 것이고, 첫 번째 항공운송의 출발지가 EU 지역이었으므로 전체 운송구간의 연착에 관하여 EC 261/2004을 적용하는 것이 역외적용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 항공사는 사안에서의 지연운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EU 지역을 출발한 첫 번째 항공운송편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항공운송이 모두 EC 261/2004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는 4p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 261/2004 제6조에서 flight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 점에서 피고는 지연 운항 여부의 판단이 복수의 항공편으로 이루어진 journeys가 아닌 개별 항공운송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결편이 포함된 운송의 경우 첫 번째 운항구간과 두 번째 운항구간은 서로 다른 flights이므로 연착의 판단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운항편의 지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EC 261/2004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JEU의 선례인 Sturgeon 사건(Christopher Sturgeon, Gabriel Sturgeon, Alana Sturgeon v. Condor Flugdienst GmbH (C-402/07); Stefan Bock Conerlia Lepuschitz v. Air France SA (C-432/07). JUDGMENT OF THE COURT (Fourth Chamber) November 19, 2009)에서 법원은 최종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것으로 인해 승객이 불편을 겪는 측면에서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이 동일하다고 설시하며 EC 261/2004 제7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연운항의 금전보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금전보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몬트리올 협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Nelson 사건(Emeka Nelson, Bill Chinazo Nelson, Brian Cheimezie Nelson v. Deutsche Lufthansa AG (C-581/10); TUI Travel plc, British Airways plc, easyJet Airline Company Ltd,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v. Civil Aviation Authority (C-629/10). JUDG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23 October 201)을 인용했다. CJEU는 EC 261/2004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손해와 몬트리올 협약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나 이상의 연결편으로 이루어지는 항공 운송계약에서 지연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최종 목적지의 도착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비행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묶어서 보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항공사가 운송계약 이행을 위해 하나 이상의 연결항공편을 제공한 경우 EC 261/2004에 따른 지연손해 보상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항공사에 의해 제공된 모든 항공편을 계약목적 달성, 즉 목적지에의 도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두 flight를 따로 검토하여 EC 261/2004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한다는 피고 항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우선적 적용효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9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운송인이 승객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그 적용대상인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동 협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29조에 두고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우선적이고 배타적인 적용을 선언하므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지연에 관한 부분 또한 협약의 조건과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주장하나 CJEU는 몬트리올 협약을 비롯한 바르샤바 체제와 EC 261/2004은 서로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Lee, C. J., 2015).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규율하는 반면, EC 261/2004은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에 대한 ‘보상’의 의미이므로 손해의 발생이 없더라도 금전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EU법규는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EC 261/2004은 영국법원의 판결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법과의 충돌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항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C 261/2004은 EU국가의 소속이 아닌 항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Flight 1의 도착지(Flight 2의 출발지)가 EU국가가 아니라는 점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쟁점 1에서 살펴본 “연결편이 포함된 운송의 지연운항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두 비행은 하나의 수단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제1운항편의 출발지가 EU지역이었던 점만으로 EC 261/2004의 적용사유가 된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가 EU 지역이 아니라면 중간기항지가 EU 국가라고 하더라도 EC 261/2004의 적용을 받는 운송이 아니게 된다.
병합된 두 개의 사건에서 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측은 자기 측에 유리한 판결이 바로 과거에 선례를 형성한 사안들을 판결한 판사들의 결론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견해를 구성해 내야 한다. 지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법적 권리에 대한 정합적인 이론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해석은 해석의 대상을 가능한 한 최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EC 261/2004에 대한 사안의 해석은 단순히 과거에 내려졌던 결정의 실질적 내용과 형식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려진 결정인지도 유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사는 선례를 읽기 전에 이미 선례들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위한 여러 해석안을 만들 수 있다. 연결편이 포함된 운송의 지연운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석안의 목록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journey와 flight의 정의는 상이하며, flight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전체의 여정이 아니라 단일한 항공편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연운항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EC 261/2004을 적용하더라도 피고가 금전보상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② flight는 원칙적으로 단일한 항공편을 의미하고 7조에는 지연운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지연운항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③ EC 261/2004의 Flight는 journey를 이루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지연운항은 전체 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연운항에 대해서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와는 달리 금전보상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배상은 받을 수 없다.
④ EC 261/2004의 flight는 journey를 이루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지연운항은 전체 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연운항은 그 결과에 있어서 지연취소와 동일한 결과와 손해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해서 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이며, 이들은 상호모순 관계에 있어 오직 한 가지만을 지연운항에 대한 금전보상청구권에 대한 해석으로 여길 수 있다. 판사는 이러한 해석에서 포착된 원리들이 실제로 법률문헌에서, 국제조약의 형성 과정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원리들 중 어느 것이 선례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제공한다고 보는가에 따라, 그리고 어느 것이 후해석적 단계의 판단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①과 ③의 해석에 따른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② 또는 ④의 해석에 따른다면 원고가 승소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사가 이러한 해석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공직자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합적으로 그 해석을 형성한 원리들을 관철시켰다면 선례의 사안들에서 내린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를 묻는다.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다면 그는 ①과 ③의 해석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EC 261/2004에서 지연운송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CJEU는 일관되게 지연운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금전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①과 ③의 견해를 취할 경우에는 원고 및 피고가 인용하는 선례들이 내린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다른 이유에서긴 하지만 판사는 ②의 해석도 배제할 것이다. ②의 해석에서 내리는 결론은 선례의 결론과 부합한다. 그러나 법률의 문언적 내용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보호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인 해석으로는 보기 힘들다. 해석이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적정절차에 관한 일단의 정합적 원리에 의해서 조직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각 경우마다 동일한 ‘소비자의 보호’라는 가치 아래에서만 지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법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권리 및 존엄의 가치의 하나로 ‘소비자의 보호’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 우선하는 가치를 위해 금전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인권, 노동과 사회복지의 수준, 환경보호 증진 등의 목적과는 사뭇 다르다. 소비자의 보호는 실정법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EC 261/2004 제5조 제3항에서 항공사가 지연의 원인이 비정상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비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항공사의 원활한 경영 또한 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Hans Kelsen의 규범주의(실정법주의)는 법에 대한 접근을 도덕 및 정치적 영향력과 같은 법외적 요소로부터 분리하고 법체계 자체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취한다(Kim, S. W., 2017).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연운송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또는 운항취소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서로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 법은 도덕의 한 분파로서 기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법체계 자체에 대한 접근에만 치중할 경우 이는 사회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Park, J. W., 2018).
판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④의 결론에 다다른다. 해석주의적 관점은 판사에게 정치구조 전체에 대한 해석, 그 사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검토하라고 요구한다. Flight를 Journey의 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지연운송에도 금전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에서 지금까지 형성해온 현재의 법관행에 해당하는지, 그 구조 전체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자연스럽게 역외적용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다. ④를 받아들임으로써 제1운항편과 제2운항편은 하나로 묶이게 되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수단으로 작용하며, EC 261/2004을 사안에 적용해도 역외적용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사안에서 피고 항공사는 EC 261/2004에서 규정하는 금전보상청구권보다 몬트리올 협약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몬트리올 협약과 EC 261/2004이 충돌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판사는 이런 경우에 불명확한 EC 261/2004의 금전보상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의회가 시작해 놓은 법률의 구조를 사회의 법관행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
법실증주의자는 여기에서 “국가들의 동의(consent)”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들이 스스로 국제법에 구속되기로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onald Dworkin, 2013). 이에 따르면 국제관행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확인 가능한 관행으로써 받아들인’ 승인규칙에 의해 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목록에 따라 조약, 국제관습, 그 밖의 자료들을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한다(Park, J. W., 2018). 이러한 동의는 국내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입법자의 의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약 해석의 관점에서 우리는 입법자의 의도, 즉 그 국제 주체가 동의하려는 “그 당시의 내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할까? 조약은 판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국제조약에 동의한 국가의 의도에 따라서 읽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국제조약의 형성 과정을 무시하고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사의 해석이 법률의 문언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그 자체에 부합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조약에 동의한 주체들의 주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약의 문언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법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제조약에 동의할 때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까? EU 국가들은 EC 261/2004에서 규정하는 금전보상청구권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승객의 불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는 단순히 조약에 서명한 사람의 희망 또는 예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리에 따라 사회 전체의 목적을 증진하는 것으로 읽혀야 한다. 국가 내부의 지배적인 신념의 정합적 체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의 경우에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정치적 도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하는 데 반해, EC 261/2004을 통해서 여객의 ‘불편’에 관한 부상을 다루어 보다 한 단계 높은 강화된 수준의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과 EC 261/2004은 충돌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금전보상청구권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
Ⅴ. 결 론
항공운송의 특성상 기존 국제법의 논의를 주도해 오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설명은 다양한 항공 사례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해석주의는 법관행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계속적인 논거 제시와 해석, 반박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요구함으로써 공동체에서의 일정한 가치를 역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국내법도 국제법과 유리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토대로 기능한다. 그런 국제법 질서는 국제법 관행에 대한 최상의 논거 제시를 통한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도덕으로서의 국제법을 심화․발전시킨다.
몬트리올 협약이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소비자이익, 즉 여객의 보호를 강조한 후 항공소비자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EC 261/2004이다. CJEU와 EU 국가의 국내 법원들은 지속적으로 EC 261/2004의 해석과 관하여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판례를 도출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형성된 법관행은 해석주의적 관점에서 항공 사례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법의 주요 법원으로 작용하는 조약, 사안에서는 EC 261/2004에 대한 해석도 결국은 조약 당사자들의 진의를 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체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 원칙들에 비춰 이해하는 과정이며 법관행을 유지하고 반영하는 모습이다. 이는 결코 국가의 단순한 조약 비준 당시 의사만을 찾아가는 것이거나, 그 상위의 자연법적 가치를 규칙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규정되고 불변하는 개념도 아니다.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 국제법이 정치적 도덕으로 기능하도록 하면서 연속적으로 진화하는 변화의 모습이다. 해석주의 국제법론의 전개는 앞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항공 사례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체화될 것이다.